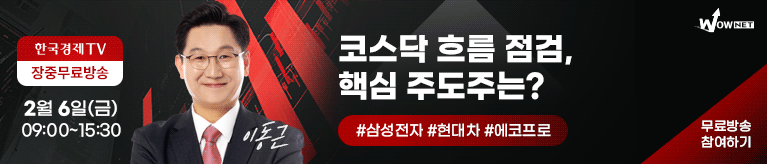“인플레이션이라는 망령이 다시 우리 곁에 왔다.” 최근 출간된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의 첫 문장이다. ‘다시’ 온 인플레이션이지만 기업과 경영자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어안이 벙벙하다. 약 30년간 이어진 물가안정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책에 인용된 독일 자동차산업 전문가의 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30년간 가격 인하 방안만 개발해왔습니다. 그들은 값을 올리는 쪽으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책은 “30년 물가안정기는 끝났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크리핑 인플레이션(물가가 느린 속도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 시대의 전략을 알려주겠다고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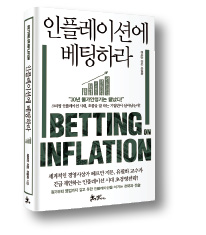 저자는 독일의 경제 석학 헤르만 지몬과 유필화 성균관대 명예교수다. 지몬은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독일 마인츠대 교수 등을 거친 지몬-쿠허앤드파트너스의 창립자 겸 회장이다. 두 사람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저로 <이익이란 무엇인가?> <아니다 성장은 가능하다> <가격관리론> 등이 있다.
저자는 독일의 경제 석학 헤르만 지몬과 유필화 성균관대 명예교수다. 지몬은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독일 마인츠대 교수 등을 거친 지몬-쿠허앤드파트너스의 창립자 겸 회장이다. 두 사람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저로 <이익이란 무엇인가?> <아니다 성장은 가능하다> <가격관리론> 등이 있다.책 초반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국가는 큰 채무자이므로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입는다. (생략) 반면에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사회복지 보조금·특정 집단을 위한 각종 보조금 등은 늘어난다.”
3장에서부터 책의 주장이 차츰 드러난다. 기업과 경영자들을 향해 “원가가 오르기 전에 값을 올려라”고 조언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민첩성”이라며 “짧게, 자주, 조금씩”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력적인 제목의 책이지만 저자의 명성에 비해 내용은 다소 허망하다. 모든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갖춘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압력으로 가격 인상을 철회한 한국 식료품 회사 경영진은 이 책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 원청업체와 공급가를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소재·부품 업체라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조정하기가 더욱 까다롭다. ‘실탄’이 넉넉한 회사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경쟁사와 달리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려고 할 수 있다. 잦은 가격 변동은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당황스럽게도 책은 간단하게 한계를 인정해버린다. “이 책에서 우리는 가격 최적화라는 중요한 전문 분야를 깊고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관심 있는 독자께서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출간한 <가격관리론>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3장의 결론은 원론적이다. “최적가격은 고객가치, 원가, 그리고 경쟁가격에 달려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값이 안정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최적가격을 결정한다.”
제목만 보면 인플레이션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할 방법을 알려줄 것 같지만, 책 내용은 인플레이션 개념에 대한 기초적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 15장짜리 책이다. 당장 써먹을 만한 전략은 10장(183쪽)에 이르러서야 나온다. ‘계약서에 가격상승 조항을 넣어라’ ‘덜 비싼 대안, 세컨드 브랜드를 만들어라’ ‘포장을 축소하라’ 같은 조언이 담겼다. 물가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심어두고, 세컨드 브랜드를 활용해 기업·제품 이미지를 지키면서 ‘가성비’ 제품을 만들어 팔라는 내용이다. 영업부서를 강화하고 재무관리를 고도화하라는 조언도 이어진다.
끝부분에서 책은 말한다.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기업과 소비자가 잃는 쪽에 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략) 기업의 반응이 결코 가격관리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영업 재무 구매 원가관리 디지털화 혁신 등도 마찬가지로 포괄해야 한다. ” ‘제목에 낚였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는 마무리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