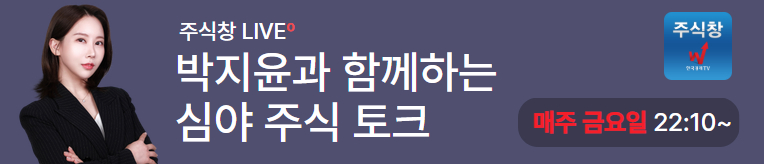“나는 이 작품을 작곡하며 종종 펑펑 울었다. 아마 이 곡은 나의 작품 중 최상(最上)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가 그의 교향곡 6번 ‘비창’을 두고 남긴 말이다. 그는 그렇게 비통한 감정을 토해낸 선율과 인간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악상으로 채워진 명작을 세상에 내놓고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1893년 11월 6일. 차이콥스키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연장 단상에 올라 그의 마지막 교향곡 6번을 지휘(초연)한 지 9일 만의 일이었다. 차이콥스키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품이 다시 연주됐을 때 공연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동료 음악가는 물론 유럽 청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의사가 발표한 그의 공식적 사인(死因)은 ‘콜레라’. 끓이지 않은 생수를 마시고 병에 전염됐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를 사실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전염병으로 사망했음에도 소독이나 검역 절차가 없었고, 접근이 제한돼야 했던 시신이었음에도 추모객이 허용됐다는 점에서다.
한동안 그의 죽음을 두고 음독설, 독살설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차이콥스키가 당시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었다. 차이콥스키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1900년대 후반 음악학자 알렉산드라 오를로바가 ‘자살설’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그는 차이콥스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 동문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영예를 중시했던 이들이 차이콥스키의 동성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명예 법정을 열어 그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것. 오를로바의 주장에 따르면 차이콥스키는 이들의 강압에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초연 직후 콜레라를 가장한 비소 투약으로 사망한 것이었다. 실제 콜레라와 비소 투약에 따른 증상은 매우 비슷했다. 그는 차이콥스키의 경우 콜레라 발병 이후 신장 기능 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시일이 보통의 환자보다 지극히 짧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의 자살설은 일부 반박이 있음에도 정황상 신뢰도가 높다는 면에서 오늘날까지 가장 높은 지지를 얻는 주장이다.
그는 차이콥스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 동문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영예를 중시했던 이들이 차이콥스키의 동성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명예 법정을 열어 그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것. 오를로바의 주장에 따르면 차이콥스키는 이들의 강압에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초연 직후 콜레라를 가장한 비소 투약으로 사망한 것이었다. 실제 콜레라와 비소 투약에 따른 증상은 매우 비슷했다. 그는 차이콥스키의 경우 콜레라 발병 이후 신장 기능 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시일이 보통의 환자보다 지극히 짧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의 자살설은 일부 반박이 있음에도 정황상 신뢰도가 높다는 면에서 오늘날까지 가장 높은 지지를 얻는 주장이다.물론 차이콥스키의 사인이 콜레라인지 비소 투약으로 인한 자살인지는 그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에 쓰인 음표만이 죽음을 앞둔 그가 기록한 유일한 언어였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통상 교향곡이 느린 2악장과 빠른 4악장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빠른 2악장과 빠른 3악장, 아주 느린 4악장으로 구성돼 있다. 3악장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며 마치 작품을 끝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청중석에서 박수가 들려오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곡이기도 하다. 생소한 형식이지만 오히려 마지막 악장에서 조용하면서도 절망에 찬 선율과 서서히 꺼져가는 불꽃을 형상화한 듯한 악상이 어우러지며 다시 한번 그의 죽음을 떠오르게 한다.
1악장은 시작부터 콘트라베이스의 어두운 음색을 배경으로 바순의 음울한 선율이 더해지며 짙은 슬픔을 드러낸다. 파도가 일렁이듯 펼쳐지는 현악기의 서정적인 선율과 순식간에 고음으로 치달으면서 펼쳐내는 극적인 표현이 인상적이다. 악센트(특정 음을 세게 연주)로 이뤄진 악상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이때 금관악기의 거대한 선율이 덧입혀지면서 최후의 작품을 암시하는 듯한 강렬함을 남긴다. 왈츠 춤곡풍의 2악장은 4분의 5박자라는 독창적인 박자에서 생동감 넘치는 선율을 즐길 수 있는 악곡이다.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우아하면서도 밝은 선율에 집중한다면 차이콥스키의 서정성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3악장에서는 스타카토(각 음을 짧게 끊어서 연주)로 이뤄진 선율과 생동감 넘치는 타란텔라(이탈리아 춤곡) 리듬이 어우러지면서 쾌활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마치 축제의 피날레 같은 절정의 환희를 펼쳐낸다.
마지막 악장. 첫 소절부터 애달픈 현악기 선율이 차이콥스키의 실의에 찬 감정을 쏟아낸다. 호른의 장대한 울림을 시작으로 전체 악기가 열정적인 선율을 켜켜이 쌓아가며 긴장감을 고조시킨 순간 금관악기가 서서히 소리를 줄이면서 헤어짐의 순간이 왔음을 알린다. 오케스트라가 계속 저음으로 파고들면서 묵직한 좌절감을 만들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만 남아 아주 조용하게 작품의 끝을 맺는다. 마치 숨이 멎는 듯이.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