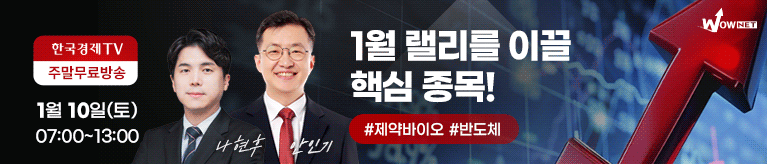세계 전쟁사에는 이기고도 해피엔딩이 되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다. 고대 그리스 에피루스의 왕 피로스 1세는 최고의 전략·전술가로 유명했다. 그는 기원전 280년 정예군 2만5000명과 20마리의 코끼리 전단(戰團)을 이끌고 로마를 침공해 군사요충지 헤라클레아와 아스쿨룸 전투에서 잇달아 승리했다.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군사 2만 명과 코끼리를 모두 잃었기 때문.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이겼다간 우리가 끝장나겠다”고 했을까.
세계 전쟁사에는 이기고도 해피엔딩이 되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다. 고대 그리스 에피루스의 왕 피로스 1세는 최고의 전략·전술가로 유명했다. 그는 기원전 280년 정예군 2만5000명과 20마리의 코끼리 전단(戰團)을 이끌고 로마를 침공해 군사요충지 헤라클레아와 아스쿨룸 전투에서 잇달아 승리했다.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군사 2만 명과 코끼리를 모두 잃었기 때문.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이겼다간 우리가 끝장나겠다”고 했을까.프랑스는 영국과의 100년 전쟁(1337~1453년)에서 마침내 승리했지만 막대한 전쟁비용으로 인해 프랑스 국민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렸다. 청일전쟁 승리로 재미를 본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 승리했지만 배상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해 12억엔의 빚만 졌다. 중국 전국시대 병법가 오기(吳起)가 천하를 손에 넣으려면 한 번 싸워 승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며 “천하가 어지러울 때 다섯 번 싸워 승부를 결정지은 나라는 재앙을 면치 못하고, 네 번 싸운 나라는 피폐해진다”고 했던 이유다.
현대판 ‘승자의 저주’는 경매,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 경제 분야에서 흔하다. 1950년대 미국 석유기업들은 멕시코만 석유시추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당시만 해도 기술이 부족해 매장량을 정확히 모른 채 공개입찰을 벌였는데, 2000만달러에 낙찰받은 기업이 결과적으로 1000만달러를 손해 봤다. 미국 애틀랜틱리치필드(ARCO)사의 석유기술자 3명이 1971년 이를 논문으로 정리하면서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해 유명해졌다. 1992년에는 미국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승자의 저주(The Winner’s Curse)>라는 책을 내 더욱 널리 알려졌다.
사람이나 기업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것은 지나친 경쟁심, 승부욕, 욕심이 이성적 판단을 흐리기 때문이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던 하이브가 전격적으로 발을 뺀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이다. 욕심이 앞서면 목표점에 이를 수 없고(欲速不達·욕속부달),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과유불급)고 하지 않았던가.
서화동 논설위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