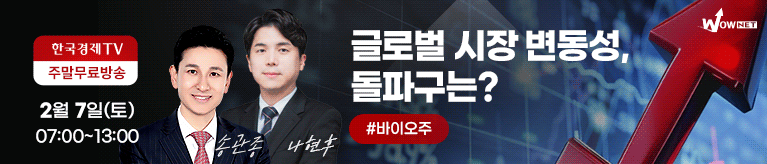동양화가에게 한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재료다. 거칠면서도 따뜻한 질감은 전통 수묵화나 채색화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하지만 그런 동양화에서조차 한지 자체가 ‘주인공’인 경우는 드물다. 그저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을 묵묵히 받쳐주는 배경 역할을 할 뿐이다.
동양화가에게 한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재료다. 거칠면서도 따뜻한 질감은 전통 수묵화나 채색화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하지만 그런 동양화에서조차 한지 자체가 ‘주인공’인 경우는 드물다. 그저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을 묵묵히 받쳐주는 배경 역할을 할 뿐이다.지정연 작가는 한지를 작품의 ‘주연’으로 내세웠다. 그는 한지를 원통 모양으로 얇게 말거나 꼬아서 캔버스에 붙인다. 한지를 빼곡히 붙이다 보면 평면의 캔버스는 어느새 별 무리로 가득한 밤하늘 같은 3차원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8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개막한 지 작가 개인전을 보다 보면 ‘캔버스 위에 공간을 창조한다’는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건축가 김동주 역시 “지 작가의 작업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낀다”고 했다. 건축가가 한옥을 지을 때 못 한 개, 나이테 속에 숨은 옹이 하나까지 흐트러짐 없이 맞아떨어지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처럼 지 작가의 한지 작업에서도 그런 섬세함이 빛난다는 것이다.
실제 작업 방식도 건축 못지않게 노동집약적이다. 수백~수천 장의 한지를 일일이 손으로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색에 변주를 주기 위해 불로 그을리거나 여러 각도로 색을 칠해야 한다. 그런 뒤에는 캔버스에 한지를 하나하나 붙이면서 공간을 차곡차곡 쌓아나간다. 형형색색의 한지로 촘촘히 메운 캔버스에선 마치 무한하게 확장하는 우주와 같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종이를 말고, 자르고, 세워서 붙이는 과정은 고되지만, 지 작가는 오히려 그 속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캔버스를 가득 메우는 시간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수행과도 같아요. 그러면서 얻는 에너지가 저를 예술의 세계로 이끌고, 내면의 빈 곳을 빼곡히 채워주죠.” 전시는 이달 14일까지.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