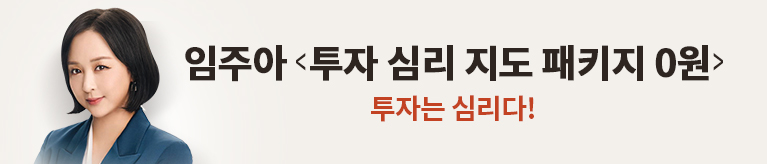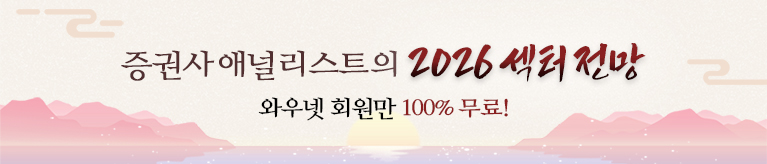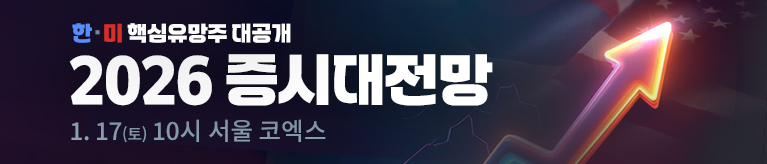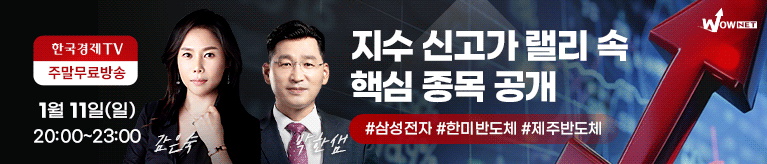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초의 ‘초거대 AI(네이버 하이퍼클로바)’가 개발된 지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 잊혔던 화두는 ‘챗 GPT’와 함께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돈은 언제 버는가’라며 눈총을 받던 초거대 AI는 다시금 핵심 원천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인고의 시간을 버텨온 소수의 나라들이 주도권을 갖고 각축전을 벌이는 형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초거대 AI 전쟁에서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한경 긱스(Geeks)가 국내를 포함한 미국·중국·이스라엘 등 주요 3개국의 초거대 AI 동향을 함께 짚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초거대 AI(네이버 하이퍼클로바)’가 개발된 지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 잊혔던 화두는 ‘챗 GPT’와 함께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돈은 언제 버는가’라며 눈총을 받던 초거대 AI는 다시금 핵심 원천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인고의 시간을 버텨온 소수의 나라들이 주도권을 갖고 각축전을 벌이는 형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초거대 AI 전쟁에서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한경 긱스(Geeks)가 국내를 포함한 미국·중국·이스라엘 등 주요 3개국의 초거대 AI 동향을 함께 짚었습니다.‘메시지버드, 플로우라이트 등 유럽 정보기술(IT) 기업이 ‘GPT-3’를 가져다 쓰기 시작하며, 비유럽권 대규모 범용 AI 시스템(초거대AI)에 서비스가 종속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공지능(AI) 연구조직 ‘생명미래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초거대 AI’를 두고 비유럽권(미국·중국·이스라엘·한국) 국가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을 짚었다. 챗 GPT 성능 기반(GPT-3.5)으로 주목받은 초거대 AI가 국가별 AI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다.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은 일부뿐이라, 주도권 싸움이 ‘국가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AI는 승자독식’이란 격언과 함께 각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추세다.
민·관 ‘이인삼각’ 달리는 미·중
 초거대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인간 두뇌’를 구현하는 원천 기술이다. 파라미터(매개변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며, 스마트팩토리·챗봇·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고도의 지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AI 인적 자원, 연구 인프라, 투자금이 꾸준히 집대성된 결과물이다.
초거대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인간 두뇌’를 구현하는 원천 기술이다. 파라미터(매개변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며, 스마트팩토리·챗봇·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고도의 지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AI 인적 자원, 연구 인프라, 투자금이 꾸준히 집대성된 결과물이다.오마바 정부 시절 AI를 국가 과제로 내세운 미국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조단위 돈을 퍼붓고 있다. 미 정부 태스크포스인 ‘국가인공지능연구자원(NAIRR)’은 앞으로 6년간 26억달러(3조241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민간 컴퓨팅 인프라 보충 등에 쏟을 전망이다. 동시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12조원 투자에 나선 오픈AI는 앞서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달리’와 챗봇인 챗 GPT의 유료화에 성공한 업체다. 구글 ‘람다’는 구글 검색페이지와도 연동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은 민·관 경계가 더 옅다. ‘중국판 구글’ 바이두는 오는 3월 챗 GPT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려 준비하고 있다. 바이두의 초거대 AI ‘어니 3.0’은 2800억개 매개 변수를 갖추고 이미 AI 스피커, 동영상 편집, 검색 등에 쓰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바이두를 ‘AI 혁신플랫폼’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끼리 협력도 정부가 나선다. 베이징대 베이징 인공지능 아카데미(BAAI)는 앞서 중국 정부가 약 600억원을 지원해 GPT-3 매개변수의 10배가 넘는 1조7500억개짜리 초거대AI ‘우다오 2.0’을 공개한 바 있다. 바이두, 샤오미 등 기업이 이사회에 참가하고 있다. 베이징에는 138억위안(2조5300억원)이 투입돼 AI 국가 단지도 조성되고 있다.
AI 인프라 자원 과제로
 이스라엘은 지난해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인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지수’에서 한국을 2단계 앞지르고 종합순위 5위를 기록했다.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엔 초거대 AI ‘쥐라기’를 개발하는 AI21랩스가 있다. 지난해 80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를 완료하며 오픈AI의 경쟁사로 우뚝 선 곳이다. 정부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고등교육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이스라엘혁신청, 재무부 등이 모인 조직 ‘텔렘’을 통해 5년간 16억달러(2조원)를 쏟기로 했다. 목표는 인적 자본 확충과 컴퓨팅 인프라 마련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인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지수’에서 한국을 2단계 앞지르고 종합순위 5위를 기록했다.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엔 초거대 AI ‘쥐라기’를 개발하는 AI21랩스가 있다. 지난해 80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를 완료하며 오픈AI의 경쟁사로 우뚝 선 곳이다. 정부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고등교육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이스라엘혁신청, 재무부 등이 모인 조직 ‘텔렘’을 통해 5년간 16억달러(2조원)를 쏟기로 했다. 목표는 인적 자본 확충과 컴퓨팅 인프라 마련이다.한국 역시 초창기부터 초거대AI 개발에 열을 올렸던 국가로 꼽힌다. 토종 기업 간 경쟁이 격발되며 네이버, 카카오, KT, LG 등에서 언어모델 매개변수를 키우고 텍스트와 이미지 학습을 넘나드는 ‘멀티모달’ 기능을 연구해왔다.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보유한 네이버는 연초 AI 연구·개발 조직을 네이버클라우드로 옮기고 검색 서비스 ‘서치GPT’ 및 기업간거래(B2B)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카카오(KoGPT), KT(믿음), LG(엑사원) 등도 물류 시스템, 건강검진, AI 은행원 등에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컴퓨팅 인프라를 중심으로 정부 예산 지원이 확대되면 국가 간 경쟁에도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던 정부는 지난달 5년간 2600억원을 투입해 학습용 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이 느끼는 효용성은 아직 미비하다. 김건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국내 초거대 AI 개발은 GPU 인프라를 갖췄다는 극소수 업체마저도 내부 연구 정도만 간신히 수행하는 수준”이라며 “정부 지원이 일선 기업과 대학에 와닿을 정도로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
참 한 가지 더
글로벌 'TOP 10' AI 유니콘은 어디?
 전 세계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 업체 중 기업 가치 상위 10개사의 80%가 미국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의 조사 결과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 업체 중 기업 가치 상위 10개사의 80%가 미국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의 조사 결과다.CB인사이츠에 따르면, 'AI 유니콘' 몸값 1위는 기업가치 140억달러(175조4200억원)를 기록한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차지했다. 바이트댄스는 숏폼 동영상 서비스 '틱톡' 운영사로 유명하지만, 추천 AI 알고리즘과 신체 추적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AI 업체이기도 하다.
2위부터 9위까지는 모두 미국 기업이 차지했다. 페어리(15조7800억원·2위), 포니닷AI(10조6500억원·3위), 앤듀릴(10조6200억원·4위) 등이 포진했기 때문이다. 물류 스타트업으로도 분류되는 페어리는 영세 소매상점 판매량을 AI로 예측해주며 설립 2년 만에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고,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펼쳐온 포니AI는 자율주행 기술을 인정받아 몸집을 키웠다. 앤듀릴은 AI 드론 업체로,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성장했다. 데이터 라벨링 업체 스케일AI와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 데이터로봇 등 AI 기술 기업들도 순위권에 포함됐다. 10위에는 중국의 개방형 로봇 플랫폼 개발사 호라이즌로보틱스가 올랐다.
조사 대상 업체를 전체(91개)로 따져도 미국 AI 유니콘 기업(53개)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국(19개)과 영국(4개)이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보다 작은 이스라엘도 3곳의 AI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AI 유니콘은 2개였다. 한국 기업은 없었다.
이시은/김주완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