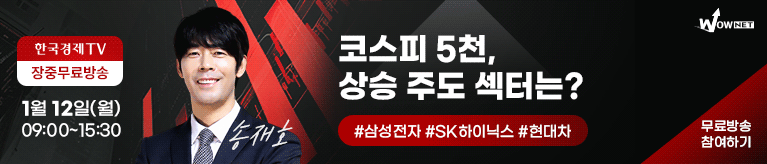피아노 연주는 능수능란했고 더블베이스는 재기발랄했다. 드럼은 원숙하게 박자를 맞추며 이들을 이끌었다. 세 연주자의 화음에선 생동감 넘치는 재즈 리듬이 흘러나왔다. 지난 5일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에멧 코헨 트리오의 첫 내한 공연 이야기다.
피아노 연주는 능수능란했고 더블베이스는 재기발랄했다. 드럼은 원숙하게 박자를 맞추며 이들을 이끌었다. 세 연주자의 화음에선 생동감 넘치는 재즈 리듬이 흘러나왔다. 지난 5일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에멧 코헨 트리오의 첫 내한 공연 이야기다.트리오를 이끄는 피아니스트 에멧 코헨(32)은 미국 재즈계의 차세대 주역으로 평가받는 연주자다. 세계 최고 권위의 재즈 잡지인 다운비트(DownBeat)가 지난해 114명의 음악평론가를 대상으로 연 제70회 평론가투표에서 코헨은 피아노 부문 라이징 스타로 꼽혔다.
그는 2011년 델로니어스 몽크 국제 피아노 경연대회 최종 결선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같은 해 필립스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우승했고, 2014년 아메리카 재즈 피아노 경연대회도 석권했다. 2019년에는 미국의 거장 피아니스트 콜 포터의 펠로십에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공연을 100회 넘게 펼치며 20·30대 관객을 끌어당겼다.

드러머 카일 풀(30), 베이시스트 필립 노리스(26) 등 멤버 전원이 1990년대 생으로 이뤄진 트리오라 더 주목받는 무대였다. 젊은 피가 출연한 무대여서 인지 평소 재즈 공연장 풍경과 달랐다. 20~30대 관객들이 로비에 진을 치고 입장을 기다렸다. 인터파크 예매자 통계에서도 20대가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대가 28.4%로 뒤를 이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탁월한 연주가 펼쳐졌다. 코헨은 건반을 물 흐르듯 어루만지는 스트라이드 연주법으로 관객들을 순식간에 집중시켰다. 양손의 박자를 달리하는 기교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내 박자를 끌어올렸다. 찰나에 수많은 화음을 치면서도 모든 음정이 정확했고 음량은 일정했다. 완벽하게 정돈된 연주가 주는 쾌감이 객석에 퍼졌다.
변주(바리에이션)하는 흐름도 매끄러웠다. 세 연주자는 말이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연주하다 순간 숨을 고르고 피아노의 스타카토(한 음씩 강조해서 누르는 연주법)로 분위기를 바꿨다. 이내 다음 프레이즈(악구)로 넘어갔다. 고속 질주하다 방향을 매끄럽게 전환하는 F1 드라이버처럼 화음을 바꾼 것이다.

베이시스트 필립 노리스도 피아노에 밀리지 않고 묵직한 저음을 내며 한 자리 차지했다. 1부 중반부 쉽사리 듣기 어려운 베이스의 솔로가 5분 남짓 이어질 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록밴드에서 기타리스트가 속주를 뽐내듯 콘트라베이스 줄을 쉼 없이 튕기며 흥취를 돋았다.
드럼이 이 모든 기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다. 드러머 카일 풀은 템포를 급하게 치지 않고 묵묵히 리듬을 조성했다. 농구 만화 '슬램덩크'에서 '송태섭'이 맡았던 포인트가드처럼 통괘한 3점 슛과 화려한 드리블은 없지만 공연 전체를 차분하게 조율했다.
멤버 모두 1990년대생으로 이뤄진 젊은 밴드라는 특징 때문일까. 설익은 연주도 눈에 띄었다. 네 번째 곡이 연주될 때까지 박자가 종종 어긋났다. 피아니스트 코헨이 템포를 한숨에 끌어 올려도 베이스와 드럼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 첫 음을 칠 때마다 엇박자가 나왔다.
변주로 받아들이기엔 과한 정도였다. 공연 중간에 코헨이 ‘Little Faster(좀 더 빠르게)’라는 주문을 내자 박자가 정돈됐고 연주가 한층 안정적으로 변했다.
드러머 카일 풀의 안정감이 약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솔로를 연주할 때였다. 비슷한 악절을 반복하며 다소 지루한 즉흥연주를 들려줬다. 공연 전체를 이끄는 능력은 탁월했지만 정작 본인이 가장 돋보여야 하는 순간엔 소극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아쉬움을 남겼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