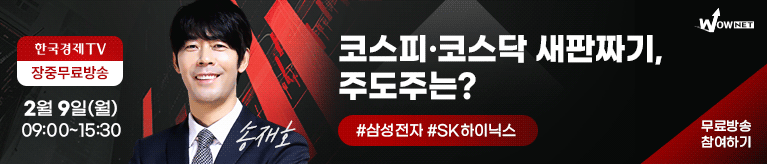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유례없는 저출산 추세 속에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이 국민연금의 시한부 운명을 앞당겼다. 9%인 보험료율을 20%까지 높이지 않고선 국민연금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장’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향후 70년간의 국민연금기금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이번 추계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에 이은 5번째 결과물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3월 예정된 최종발표에 앞서 인구·경제 변수의 중위값을 가정한 시산 결과를 내놨다.
시산 결과 9% 보험료율과 40% 소득대체율, 65세부터 수급 개시 등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2041년이던 기금 정점은 1년 빨라지고, 완전 고갈 시점도 2년이 당겨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가 국민연금의 미래를 어둡게 한 핵심 원인이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1.27명으로 예상했던 올해 출산율 전망치는 0.73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50년 이후 중장기 가정치도 같은 기간 1.38명에서 1.21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기대수명은 2023년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5년 전 계산시보다 0.4~0.7세 가량 높아졌다.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향후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수) 최고치도 124.1%에서 143.8%로 치솟았다. 향후 70년 간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1%에서 0.7%로 낮아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인구와 경제 두 제도변수가 모두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히 연금 소멸을 피하기 위한 부담도 늘었다. 추계위에 따르면 수지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8.20%(4차)에서 19.57%(5차)로 1.37%포인트 높아졌다. 9%인 보험료율을 두 배로 높여도 적자를 피할 순 없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3월 최상 및 최악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망을 담은 최종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9월까지 정부의 연금개혁방향이 담긴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나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역대 정부가 연금개혁을 차일피일 미룬 대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연금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인 저출산·고령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6년 간 제도개혁은 전무했다.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진 2018년, 문재인 정부는 4차 재정계산을 통해 고갈 시점이 빨라진다는 결과를 받아들고도 연금개혁을 흐지부지 다음 정권으로 넘겼다. 개혁을 5년 미룬 결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이 내야할 보험료는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 생존 위해 내야할 보험료 5년 만에 10%↑
26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은 4차 재정계산 대비 1.66~1.84%포인트 상승했다. 가장 달성이 쉬운 기준으로 추계기간인 70년 후(2093년)까지 기금 적립액 목표를 그해 총지출 대비 1배로 잡을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 17.86%로 4차 계산 당시 제시한 2020년 16.02%에 비해 1.84%포인트 상승했다.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에 성공해 최단기간인 2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에 나섰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수지 균형을 이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보험료율은 2020년 18.20%에서 2025년 19.57%로 1.37%포인트 높아졌다. 보험료율 인상이 10년이 미뤄졌을 때 추정치는 4차 계산 당시 2030년 기준 20.22%이었던 것이 이번 계산에선 2035년 기준 22.54%로 2.32%가 높아졌다. 어떤 목표치를 잡더라도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해지기 위해 가입자들은 소득의 5분의1을 보험료로 내야하고, 연금개혁을 5년 미룬 결과 내야할 보험료는 10% 이상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 유일한 해결책인 부과 방식(그해 가입자들에게 걷은 보험료로 연금지출을 충당)으로 전환했을 때 부담도 크게 높아졌다. 시산 결과 기금 고갈 시점 부과방식비용률은 26.1%(2055년)로 4차 재정계산 당시 24.6%(2057년)대비 1.5%포인트 높아졌다. 인구 구조 악화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은 점점 높아져 2078년 35%로 정점을 찍게 된다. 월소득이 300만원이면 105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의료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세금, 전기·난방비 등 각종 공과금을 합하면 번돈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2023년 1.7%에서 2050년 6.3%로 오르고, 2080년 9.4%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개발협력기구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12.2%, 국방지출의 비중은 2.6%였다. 한해 국내에서 생산된 가치의 10분의1, 국방비의 4배 가량을 노령층 연금지급에 쓰게 된다.
○출산율 1.2명으로 반등 가정...“너무 낙관적”
이 같은 결론은 그마저도 합계출산율이 올해 0.73명에서 2046년 이후 1.21명으로 안정화된다는 가정 하에서다. 추계위는 시산을 위해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의 중위 가정을 적용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이 회복되고, 출생아 수가 70만명을 넘는 1991년생의 30대 진입 등 통계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란 분석이다.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저위 가정에선 장래 출산율 회복치는 1.02명에 그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회복될 것으로 여겨졌던 혼인도 작년 1~11월까지 17만1814건으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보다 되려 0.5% 줄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를 할 때 향후 정부의 정책의지 등을 담아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란 중위 가정을 택하는데 다소 낙관적인 가정”이라며 “실제로는 저위 가정이 더 현실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