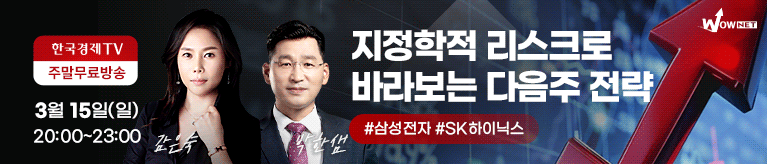‘가지 않은 길’로 유명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에게 은행은 무척 얄미운 곳이었나 보다. 그는 은행을 이렇게 정의했다. “맑은 날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 오는 날 우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곳”이라고.
‘가지 않은 길’로 유명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에게 은행은 무척 얄미운 곳이었나 보다. 그는 은행을 이렇게 정의했다. “맑은 날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 오는 날 우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곳”이라고.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은행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 왔다. 은행원은 공무원과 더불어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혀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는다. ‘문턱이 높은 곳’이란 이미지가 굳어져 민간기업인데도 금융기관으로 불렸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 은행권은 주 4일제 논의에도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은행이 역대급 희망퇴직 프로그램으로 또다시 시샘의 도마 위에 올랐다. 퇴직하면 으레 ‘칼바람’이 연상되지만 찬 기운은 전혀 느낄 수 없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복지다. 최대 39개월 치 특별퇴직금에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여행상품권까지 지급한다. 직종에 따라 1년 후 계약직으로 은행 재고용 기회까지 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이 스스로 퇴직 신청 기준 연령을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에선 “많이 줄 때 떠나자”며 작년 말과 올초 사이 3000여 명이 희망퇴직 러시를 이루고 있다. 부지점장급은 일반 퇴직금에 희망 퇴직금을 더해 평균 4억~5억원, 최대 7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치 명퇴금을 주는 제조업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남아 있는 직원들 역시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놀이’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은행들은 280~4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들의 두둑한 보너스 잔치 이면에는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신음하는 영끌족의 고통이 깔려 있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의 두께는 직원 복지의 두께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설 연휴를 계기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1시간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의 정상화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와 복지에는 약삭빠르면서 고객 서비스는 뒷전인 직업군을 그 누가 예뻐하겠는가.
윤성민 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