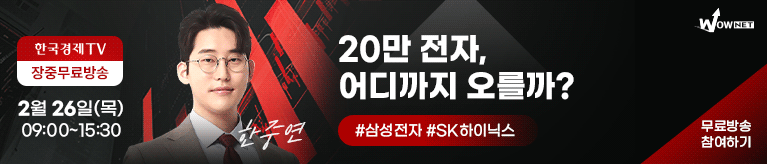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메모리사업부엔 대형 전자시계가 하나 있다. ‘레전드 오브 월드 넘버원’(세계 1위의 전설)이란 문구가 새겨진 이 시계는 30일 현재 ‘29년 364일’을 표시하고 있다. 숫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수성한 기간이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앞자리가 30년으로 바뀐다.
한 기업이 30년 넘게 특정 시장에서 1위를 지킨 건 세계 산업사에 흔치 않은 대기록이다. 위기 때마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삼성 경영자들의 혜안과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대기록을 이어온 배경으로 꼽힌다.
‘과대망상’ 비웃음에도 대규모 투자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른 건 1993년이다. 당시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기준 시장 점유율은 10.8%. 1980년대까지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던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일본 반도체 기업을 제쳤다.
삼성전자는 1974년 한국반도체 인수를 계기로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다. 순탄치만은 않았다. 1983년 2월 반도체의 중요성을 꿰뚫어본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반도체 중에서도 첨단기술인 초고밀도집적회로(VLSI)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도쿄 선언’이다.
가전용 반도체만 만들어온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은 경쟁사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인텔 경영진이 이 창업회장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을 정도였다.
‘스택’ 방식 선택한 KH의 결단
삼성은 보란 듯이 신화를 써내려갔다. 그해 11월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했다. 선진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던 인재들을 불러 모아 ‘24시간 개발 체제’를 가동한 결과다. 1985년엔 반도체 수출 1억달러를 달성했다.1987년은 삼성 반도체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당시 삼성을 포함한 20여 개 반도체업체가 4Mb(메가비트) D램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숙제는 ‘입체 구조’로 D램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었다.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됐다. 지하로 파는 ‘트렌치’ 방식과 건물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스택’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 쉬운지’에 대해 고민한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은 ‘스택’ 방식을 선택했다. 고비용의 트렌치 방식을 택했던 일본 업체는 대부분 몰락했다.
30년 이어진 ‘세계 최초’ 행진
이후 30년은 ‘세계 최초’ 수식어의 연속이었다. 256M D램(1994년), 1G D램(1996년), 20나노급 D램(2011년), 3차원 V낸드(2013년), 10나노급 D램(2016년) 등이 대표적이다.비결로는 총수들의 과감한 투자가 꼽힌다. 1980년대 후반 경쟁사의 저가정책과 경기불황으로 반도체산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삼성 총수들은 ‘역발상 투자’에 나섰다. 1991~1992년 총 1조2500억원을 신규 라인에 투자했다. 거짓말처럼 호황기가 왔고, 삼성전자는 확보해둔 생산능력을 앞세워 세계 1위를 차지했다.
1999년엔 화성캠퍼스 조성을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엔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다. 2005년 삼성의 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뛰었다.
인재 관련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출신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IBM에서 일하던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을 삼성으로 이끈 것도 총수들이다.
이 같은 ‘성공 방정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D램 공정에 대당 2000억원 수준인 극자외선(EUV) 노광장치를 적용하는 것도 삼성전자가 가장 빨랐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차세대 슈퍼컴퓨터용 초고속 D램, 메모리반도체와 AI반도체를 결합한 ‘HBM-PIM’ 등과 관련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최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도 만만찮다. 앞으로의 30년은 ‘신개념 메모리’로 1위 자리를 지킬 계획이다.
메모리반도체에 다른 반도체들을 패키징한 신제품을 앞세워 고객사에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CXL’로 불리는 기술을 통해 한 개의 고성능 메모리를 여러 반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제품도 세계 최초로 내놨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