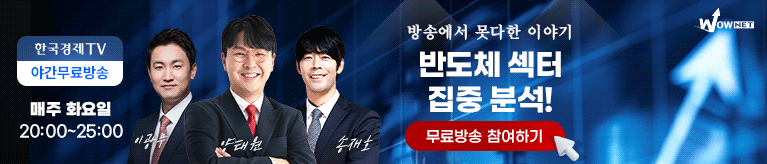9대에 걸쳐 이어온 도공의 길
영남요에선 도자기를 굽는 모든 과정에 전통 기법을 사용한다. 발 물레부터 전통식 ‘망댕이(식용 무를 일컫는 영남 방언) 가마’까지 흙과 물, 나무, 불 등으로만 백자를 빚어낸다. 기계를 멀리하는 것은 영남요 7대 도공(陶工)인 김 사기장이 65년째 지켜온 고집이다. 그의 고집에는 가업을 오롯이 지켜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김 사기장은 달항아리, 다완(찻사발) 등 백자를 빚고 있다.그는 전통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매진해왔다. 조선 영조시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나무 물레 앞에서 하루 8시간가량 그릇을 빚는다. 전기 물레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김 사기장은 “좋은 백자는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는데 최적의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나무 물레가 좋다”며 “완벽한 백자를 빚어내기 위해 전통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자기를 굽는 과정도 중요하다.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노심초사하는 시간이다. 가마에 넣기 전에 늘 고사를 지낸다. 불 조절에 실패하면 정갈한 백자가 나오지 않는다.
전통 가마인 망댕이 가마에 소나무 땔감을 넣어 섭씨 1300도를 맞춘다. 이 온도를 18~24시간 동안 유지한다. 수은주는 따로 없다. 사기장이 불길을 내내 지켜보며 땔감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식이다. 초벌구이를 거친 백자도 폐기하는 게 다반사다. 10개를 가마에 넣고 구우면 7~8개는 부수는 편이다. 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북 민속자료로 지정된 망댕이 가마는 우리나라 특유의 전통가마로 무 모양의 흙덩어리를 경사로에 따라 5~6칸씩 쌓은 가마를 일컫는다. 불길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망댕이 가마를 거친 백자 표면에는 순백색 빛이 감돈다. 김 사기장은 “백자의 색은 불이 결정한다. 전기, 가스 등을 사용했을 때는 전통 가마와 같은 색감이 나오지 않는다”며 “일평생 해온 일이지만 불을 아는 건 쉽지 않다. 그릇에 생명을 불어넣는 불을 다루는 건 오직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예(藝)에는 요행이 없다
65년의 도력(陶力)을 자랑하지만 김 사기장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진 건 1987년부터다.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특별상을 두 차례 연속 받으면서다. 전통을 고수한 끝에 1991년 대한민국 도예 명장 1호로 선정됐고, 1996년엔 국가무형문화재 105호라는 영예를 얻었다. 국내에서 도자기 관련 무형문화재는 김 사기장이 유일하다.마침내 세계인이 그의 백자에 홀리기 시작했다. 1996년 미국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서 상설 전시회를 개최한 뒤 캐나다 온타리오 왕립박물관, 베를린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기 박물관 등에 그의 백자가 놓였다. 1999년 달라이 라마가 한국을 찾아왔을 때, 2010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백산의 작품이 선물로 쓰였다.
1960년대 저렴하고 가벼운 스테인리스 그릇 등이 양산되면서 가업이 끊길 뻔했다. 백자가 헐값에 팔리거나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김 사기장은 우직하고 꿋꿋하게 백자를 빚고, 구웠다.
300년 역사 가업은 이제 백산의 아들인 김경식 영남요 대표(56)와 손주 김지훈 씨(27)가 이어가고 있다. 김 사기장이 아들과 손주에게 도예를 전수하며 강조하는 건 단 하나다. 예에는 요행이 없다는 것. 김 사기장은 도공의 길을 이렇게 요약했다. “도예에 ‘적당히’란 단어는 없습니다. 정직함과 자연스러움이 백자에 배어나려면 땀과 집념이 필요하죠.”
문경=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