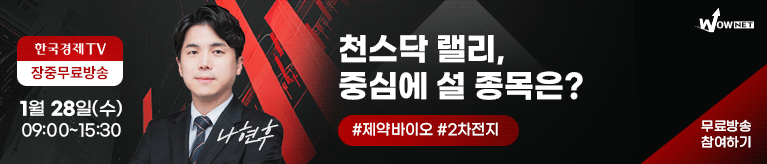경북 봉화군 광산 사고로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지난 4일 무사 생환한 기적이 이태원 참사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봉화 사고의 초기 대응체계가 이태원 참사와 다를 게 없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으로 현장 컨트롤타워가 먹통이 돼 시추 좌표를 엉터리로 잡는 등 구조작업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경북 봉화군 광산 사고로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지난 4일 무사 생환한 기적이 이태원 참사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봉화 사고의 초기 대응체계가 이태원 참사와 다를 게 없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으로 현장 컨트롤타워가 먹통이 돼 시추 좌표를 엉터리로 잡는 등 구조작업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초기 사고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현행 광산안전법상 광산 사고가 날 경우 광산 측이 자체 안전구조대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갱 내 상황을 119구조대가 알기 어렵고 암석이나 지질 특성 등을 광산업체가 가장 잘 안다는 이유다. 현장에선 국민 생명 보호에 총력을 쏟아야 할 정부가 법을 핑계 삼아 광산업체에 구조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사고 초기 현장 지휘책임자는 산업부 산하기관의 사무관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영세한 광산업체가 구조에 큰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목숨 걸고 구조에 나선 대원들의 식사도 안쓰러울 정도로 부실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사고 발생 엿새째인 지난달 31일까지 구조를 위해 동원된 시추기는 두 대뿐이었다. 1차 구조 시도 때는 지하 170m까지 뚫었지만 아예 시추 좌표가 잘못돼 실패로 끝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현장을 찾은 이철우 경북지사의 상황 판단은 달랐다. 이 지사는 “비용이 부족하면 경상북도가 장비, 인건비 모두 책임질 테니 전국에서 시추기를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등에서 동원한 시추기가 총 12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9일 만에 구출된 베테랑 광부 박모 반장(62)은 “금방 구조될 줄 알고 커피 믹스 30개를 사흘 만에 모두 소진했다”고 말했다. 190m 지하에 고립됐던 광부들은 나머지 6일 동안은 갱도의 물방울로 버텼다.
안동병원의 주치의는 “사흘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뻔했다”고 했다. 박 반장은 “헤드랜턴의 배터리가 다해가자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했다. 다시 희망을 찾게 한 건 발파 소리였다. 광산업체에 구조 책임을 미룬 아마추어식 초기 대응으로는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국가의 주요 책무이자 존재 이유다. 대응 시스템 부재로 촌각을 다투는 구조 골든타임의 순간을 놓쳤다면 그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비슷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똑같은 시행착오를 막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