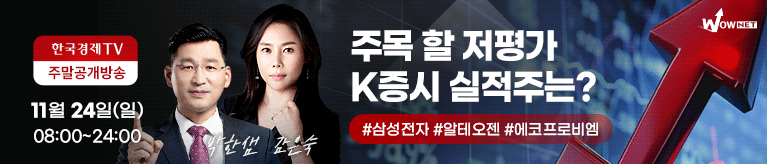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탓에 미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찌감치 저축한 돈으로 소비를 이어나갈 수 있어 치솟는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층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Fed가 내년 초 기준금리를 연 4.6%까지 올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보다 높아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차입 비용이 불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수요가 위축되면 고공행진하는 물가는 안정세를 되찾는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소비의 바탕이 되는 가계 저축액이 크게 불어났다. 미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 영향이다. Fed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미국 가계의 저축액은 1조7000억달러(약 2419조원) 늘었다.
구인난에 따른 임금 상승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저축액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늘어난 임금으로 소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각종 혜택을 측정하는 고용비용지수(ECI)는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했다.
WSJ는 “주택시장은 깊은 침체로 접어들고 있지만 나머지 경제 부문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Fed가 긴축 기조를 밀어붙여도 미국 경기는 쉽사리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며 “내년 미국 기준금리는 최소 연 5.25%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컨설팅 업체 TS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 5.5%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