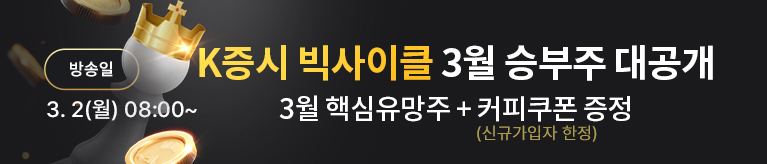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임금 5.2% 인상과 주 36시간(4.5일제) 근무 도입 등을 주장하며 16일 강행한 총파업이 시중은행 조합원들에게 외면받았다. 전국 모든 은행 영업점과 전산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도 은행권의 파업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은행의 파업 참가율은 0.8%에 그쳤다. 예·적금과 대출 상품의 비대면 거래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은행 고객들의 불편도 없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돌아 ‘귀족 노조’로 불리는 은행원들의 파업이 일반 국민은 물론 은행원들의 공감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 파업이냐” 자조 섞인 반응도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39개 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3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1만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권은 980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했다. 전체 은행원(10만4000명)의 약 9.4%만 참석한 셈이다. 2016년 총파업 당시 참가자(1만8000명)와 참여율(1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노조는 파업 찬성 비율이 93.4%에 달했던 만큼 10만여 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참석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형 사업장인 5대 은행이 사실상 파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5대 은행은 노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 등 회사별로 100명가량만 참여했다. 농협을 제외한 4대 은행의 2016년 총파업 참여율(2.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본점 부산 이전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상대적으로 파업 참여율이 높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노조원의 76%와 48%인 1600여 명과 460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진행한 가두 행진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글자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은 산업은행 노조원들이 선두에 섰다. 파업 참가자들 사이에선 “총파업이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 파업이 됐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명분 없는 파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국책은행 파업 참가자도 적지 않았다. 한 산업은행 파업 참가자는 “본점 부산 이전에 반대하기 위해 금융노조의 무리한 파업에 숟가락을 얹은 꼴”이라며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5%대 임금 인상과 4.5일 근무를 주장하면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명분 없는 ‘기득권 지키기’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난 것은 조합원의 호응조차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노조가 지난 14일 교섭에서 임금 인상 요구안을 당초 6.1%에서 5.2%로 낮췄지만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산업은행(1억1370만원)을 비롯해 4대 시중은행(1억550만원)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웃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억대 연봉자들이 임금을 5% 넘게 올려달라며 파업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금융노조가 주장하는 주 36시간(4.5일) 근무도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많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을 1시간 단축해 놓고 근무시간을 더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올 들어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과 수조원대 이상 외화 송금 등 잇따른 사고로 은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점도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외면한 배경으로 꼽힌다. 총파업이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의 동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형/박상용/이소현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