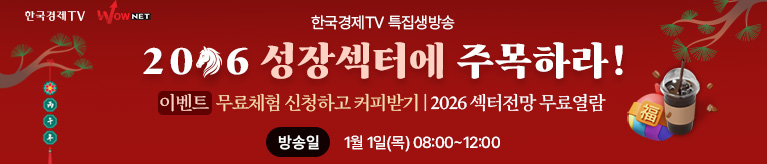‘포스코 잔혹사’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정부가 “태풍 힌남노 피해 책임을 묻겠다”며 포스코 지배구조를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00년 10월 민영화된 포스코는 현 최정우 회장 이전 8명의 회장이 모두 중도 퇴진한 트라우마가 있다. 정권마다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긴 탓이다. 대선 6개월여 만에 포스코가 또 다른 태풍을 만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 민관합동 ‘철강 수급 조사단’을 꾸려 포항 철강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철강 공급 영향을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태풍 힌남노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해 포스코 지배구조를 겨냥했다.
정부가 이번 태풍 피해가 ‘인재’라는 점을 부각하며 포스코에 칼끝을 겨눈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49년 만에 고로 가동이 멈추고 압연 설비 복구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포스코 침수 피해가 철강을 넘어 자동차 가전 등 산업계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사고 원인 파악과 복구가 최우선이다. 천재지변을 맞은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언급은 어불성설이다. 침수 피해 방지와 지배구조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6일 새벽 시간당 110㎜의 폭우로 인근 냉천이 넘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겼다. 아무리 철저히 대비했더라도 불가항력적 재해를 포스코가 막을 수 있었겠나.
더구나 포항시가 공원화 사업을 위해 냉천을 메우면서 강폭이 좁아져 불어난 물이 인근 마을과 공장을 덮쳤다는 게 주민들과 포스코의 하소연이다. 포스코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태풍종합상황실 운영, 조업 중단, 배수로 정비, 물막이 작업 등을 했지만 침수를 막을 수 없었다”며 “3개월 안에 압연 라인을 복구하겠다”고 했다. ‘대비를 소홀히 했고 공장 정상화에 최장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설령 포스코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손실을 본 주주들이 대응하면 될 일이다. 지분이 전혀 없는 정부가 나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은 아니다. 포스코의 지분 구성은 외국인 52.67%(블랙록 5.02%, 일본제철 3.3%), 국민연금 8.3%, 국내 기관 18.8% 등이다.
정부가 포스코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직도 ‘관치 경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세계 6위(지난해 철강 생산량 기준)의 민간 철강업체 포스코를 사실상의 국영기업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태풍을 핑계로 포스코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뭔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전임 권오준 회장은 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임기 2년을 남기고 돌연 사퇴했다. 대통령 동행 경제사절단에서 잇따라 빠지고, 검찰 등 사정당국의 표적설까지 돌자 버티지 못했다. 문 정부는 뒤를 이은 최 회장도 연임을 시도하자 흔들어댔다. 산업재해 증가 등을 명분 삼아 여권과 노동·시민단체 주도로 연임 반대 토론회까지 열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민간 기업 CEO의 거취에 압력을 행사할 어떤 명분이나 자격, 권한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