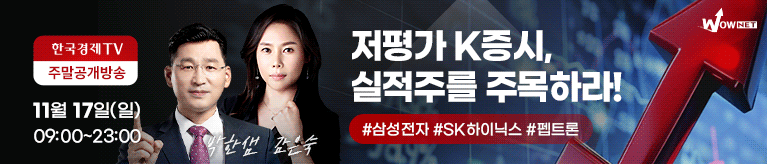미국에서 물가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기대가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발작’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물가도 제어되지 않는 상황이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까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450원까지 넘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일 새 4% 폭등
1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서만 4.0%(53원30전) 폭등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불과 1주일 사이에 원화 가치가 대폭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7원30전 오른 1390원90전에 마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30일(1391원50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장 중 달러 대비 엔화와 위안화 환율이 내림세로 돌아서고, 코스피지수도 소폭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진 않았다”며 “외환당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20~21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인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원·달러 환율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은 “미국 물가 충격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이라며 “초단기적으로 9월 FOMC까지 1400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달러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상 원·달러 환율의 내림세 전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47% 오른 109.93을 기록했다. 김승혁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 1450원까지도 상단을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외환거래량도 하루 평균 300억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은행 간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305억1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량(268억7000만달러)보다 13.5% 늘어난 규모다. 2년 전(257억6000만달러)과 비교하면 18.4% 확대된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면 외환거래 규모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부 “가용 대응조치 점검”
정부는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활용 가능한 조치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에 주의하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대응 조치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하지만 급등하는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봤던 지난달 23일 이후 실질적인 구두 개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외환당국이 직접 달러를 매도해 개입에 나설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을 소진해야 한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강(强)달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외환보유액을 쓰면서 환율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조정,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달러 유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당국은 당장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미현/황정환/이호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