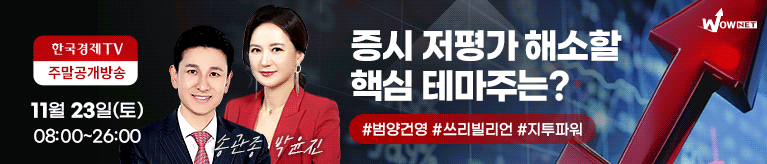세어 보니 96명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연주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오케스트라 단원 수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현악 연주회 무대와는 다르다. 중앙 앞쪽에 마땅히 있어야 할 포디엄도, 지휘자도 없다.
지난해 말 출범한 고잉홈프로젝트가 처음 여는 음악축제 ‘더 고잉홈 위크’(7월 30일~8월 4일)의 첫 공연 현장이다. 고잉홈프로젝트의 모태는 2018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연주자들을 불러 모아 결성한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PFO)다. 여기서 만난 플루티스트 조성현, 첼리스트 김두민, 호르니스트 김홍박 등이 주도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연주자 중심의 프로젝트 악단을 창단했다. 14개국 50개 교향악단의 전·현직 단원 80여 명이 모였다. 한국인뿐 아니라 ‘친한파’ 외국 연주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악단의 특성을 살려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한국 클래식 연주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공연을 첫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바로 지휘자 없이 연주하는 ‘봄의 제전’이었다.
해외 활약 韓연주자 한자리에

과연 연주가 될까 싶었다. ‘봄의 제전’은 온갖 타악기와 관악기가 동원되는 대편성 작품이다. 1913년 초연 당시 클래식 음악사의 가장 유명한 소동을 일으킨 불협화음과 복잡하고 괴이한 리듬, 현란하게 변하는 박자가 난무한다. 박자와 리듬감이 뛰어나지 못한 지휘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난곡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모험적 시도는 통했다. 연주자들만의 호흡과 역량으로 연주하는 ‘봄의 제전’은 신선한 충격과 진귀한 경험을 안겨줬다. 바순이 홀로 연주하는 신비로운 고음 선율에 이끌려 호른, 클라리넷, 잉글리시호른, 플루트, 오보에, 베이스클라리넷, 피콜로, 트럼펫 등 무대에 방사형으로 넓게 포진한 관악기가 차례로 깨어났다. 이윽고 이 작품의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현악의 강렬한 리듬에 맞춰 관악, 타악 파트가 본격적으로 어우러졌다.
K클래식 다지는 토양 기대
긴장한 탓일까. 초반의 관악 앙상블이 다소 불안했지만 연주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각 파트는 제 소리를 거칠 것 없이 선명하게 뿜어냈다. 다 함께 소리를 내는 총주에서는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과시했다. 물론 노련한 지휘자가 모든 상황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연주와는 달랐다. 악기 간 밸런스가 때때로 불안정했고, 공연장의 울림까지 고려한 다이내믹(셈여림)의 섬세한 조절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다. 악장 스베틀린 루세브가 이끄는 이심전심의 ‘자율적 통제’로 자신들만의 연주를 뚝심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갔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의 기운과 에너지가 느껴졌다. 원초적인 생명력을 노골적으로 거친 리듬과 화성으로 표현한 원곡의 특성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커튼콜에서도 보기 드문 풍경이 연출됐다. 지휘자 또는 지휘자가 지정하는 연주자들만 인사하는 여느 공연과는 달리 96명의 연주자 전원이 객석을 향해 다 함께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연주자 개개인 모두가 연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연의 주인공임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프랑스 악단 ‘레 디소낭스’와 같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4일에는 스페인 거장 후안호 메나의 지휘로 브루크너 교향곡 6번을 들려준다. 이들의 목표는 해외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오케스트라와 음악회의 틀을 깨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시도를 통해 K클래식의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번 음악축제를 시작으로 1년에 네 차례 연주회를 열겠다는 고잉홈프로젝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첫발은 잘 내디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