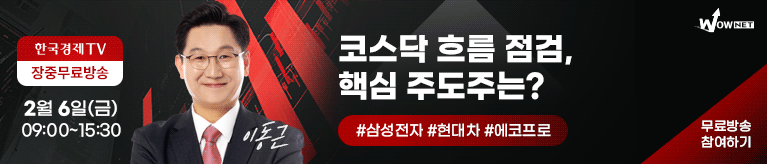‘잠’과 ‘미술관’은 그렇게 가까운 조합은 아니다. 미술작품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 같이 간 사람에게 ‘교양 없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이 전시회는 다르다. 입구에 들어서면 동물의 탈을 쓴 채 벽에 기대서, 앉아서, 누워서 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다.
좀 더 깊숙히 들어가면 관람객들이 잘 수 있는 침대까지 마련해놨다. 나른한 피아노 음악과 아로마 디퓨저까지 제대로 재우기 위해 판을 깔아줬다. 지난 19일부터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나의 잠’이다.

모두 19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 전시회를 관통하는 주제는 ‘잠’이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회화, 조각, 설치미술, 영상 등으로 저마다의 잠을 표현했다. 전시를 총감독한 유진상 계원예대 교수는 기획 배경에 대해 “경쟁사회에서 통상 잠은 줄여야 하는 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사실 잠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며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1인칭의 세계’라는 점을 조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건 당나귀, 양, 쥐, 곰, 돼지, 너구리 등 동물 탈을 쓴 채 저마다의 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화물차 운전사, 영화배우, 경비원 등 직업도 다양하다. 그 앞에는 자그마한 표지판이 있다. “양탈을 쓴 이 남성 분은 태권도 사범입니다. 주로 6세에서 15세 사이의 연령대의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남성분은 하루 여섯 시간 퍼포먼스에 참여하면서 하루 미화 90달러를 받습니다.”
사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설치미술이다. 김홍석 작가는 이들에게 ‘침묵의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들은 잠드는 것도, 쉬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아닌 경계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메인 전시장을 넘어서면 작가 개인의 경험을 투영한 작품들도 곳곳에 있다. 이성은 작가의 작품이 그렇다. 카메라와 거울, 모니터로 이뤄진 작품에 관람객이 눈을 갖다대면 마치 유체이탈을 하듯이 2~3초 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에게 잠은 일상이다. 일상생활 도중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신경질환인 ‘기면증’을 앓고 있다. 연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이 작가가 예술의 길로 접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기면증 환자에겐 자각몽과 유체이탈이 일상이고, 잠과 삶의 경계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민수 작가는 낮과 밤이 뒤바뀐 사람들의 삶을 조명했다. 신문사 윤전실에서 일했던 오 작가의 아버지의 경험에 착안해 만든 영상 ‘신기술’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윤전기의 소음을 담았다. 그 옆에는 컨베이어롤러 위에서 옮겨지는 택배, 스티로폼 부스러기에 파묻힌 모터 등을 통해 배달 업체, 물류 창고 등에서 일했던 오 작가의 경험을 담았다. 전시는 9월 12일까지.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