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마다, 북디자인》(김경민 지음, 싱긋)은 10년 넘게 북디자이너로 일한 저자가 책을 자르고 붙이고 만들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았다. 북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할까. 저자의 출판사 선배는 소개팅을 나갔다가 ‘드럼(북)을 만드시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저자는 ‘북디자이너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라도 말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책을 썼다고 설명한다.
《날마다, 북디자인》(김경민 지음, 싱긋)은 10년 넘게 북디자이너로 일한 저자가 책을 자르고 붙이고 만들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았다. 북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할까. 저자의 출판사 선배는 소개팅을 나갔다가 ‘드럼(북)을 만드시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저자는 ‘북디자이너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라도 말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책을 썼다고 설명한다.북디자이너는 겉으로 보이는 책의 모든 것을 꾸민다. 표지부터 본문의 글꼴, 줄 간격, 글과 사진의 배치 등이 모두 북디자이너 소관이다. 저자는 “본문 디자인에 따라 (독자가) 내용을 얼마나 흡수하며 읽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으스스한 호러 소설에 귀여운 본문 디자인이 들어간다면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지금은 베테랑이지만 실수를 연발하던 시절도 있었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잘못 표기해 동료들이 물류창고로 총출동해 스티커를 덧붙이는 작업을 하게 하고, 표지에 저자명을 잘못 쓰기도 했다. 퇴사와 이직 과정에서 악덕 출판사 사장도 여럿 만났다. 저자는 이런 일화들을 소개하며 “후배들은 시행착오를 덜 겪길 바란다”고 했다.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한 사람, 예비·신입 북디자이너 모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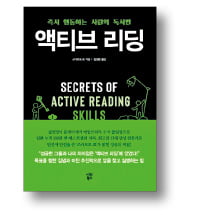 《액티브 리딩》(쓰카모토 료 지음, 시원북스)은 책을 읽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실용서다. 저자는 일단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버리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책 읽는 부담이 줄어들고, 책에 쉽게 손이 간다. 책을 많이 읽기 위한 첫걸음이다.
《액티브 리딩》(쓰카모토 료 지음, 시원북스)은 책을 읽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실용서다. 저자는 일단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버리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책 읽는 부담이 줄어들고, 책에 쉽게 손이 간다. 책을 많이 읽기 위한 첫걸음이다.그다음 지침은 인풋과 아웃풋의 시간 간격을 줄이라는 것이다. 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겨보라는 것이다. 경제경영서나 자기계발서를 읽는 목적은 책에서 얻은 힌트를 행동으로 연결해 성과를 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빨리 읽어도 되는 부분과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 할 부분을 구별해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건너뛰고, 알고 싶은 부분을 집중해서 읽으면 된다. 저자는 고등학교 시절 문제아였다. 이런 방법으로 뒤늦게 입시 공부에 나서 사립 명문 도시샤대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 들어가 심리학 전공으로 수석 졸업했다.
 《서평이 언어》(메리케이 윌머스 지음, 돌베게)는 영국 서평 전문지 ‘런던 리뷰 오브 북스(LRB)’ 공동 창립자이자 선임 편집장이 쓴 에세이와 서평을 묶었다.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올리버 색스의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제목을 지은 주인공이기도 하다.
《서평이 언어》(메리케이 윌머스 지음, 돌베게)는 영국 서평 전문지 ‘런던 리뷰 오브 북스(LRB)’ 공동 창립자이자 선임 편집장이 쓴 에세이와 서평을 묶었다.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올리버 색스의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제목을 지은 주인공이기도 하다.40여 년간 ‘런던 리뷰 오브 북스’를 이끌며 수많은 책을 읽어본 저자가 다다른 결론은 이렇다. “세계는, 그리고 인간과 삶은 결국 그 하나하나가 고유한 서사이자 한 권의 책이며, 그것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히 ‘읽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부커상 후보 작가이자 언론인인 존 랜체스터는 윌머스의 서평을 두고 “단순히 책 한 권을 요약했다기보다 세상 전체를 통찰한 글”이라고 평했다.
책은 197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쓴 윌머스의 글 23편을 실었다. 15편의 서평을 제외한 에세이 8편은 육아 경험, 이국의 친지, 어린 시절 살았던 벨기에 브뤼셀 등을 다뤘다. 우아한 문장과 때로는 짓궂은 유머의 조화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