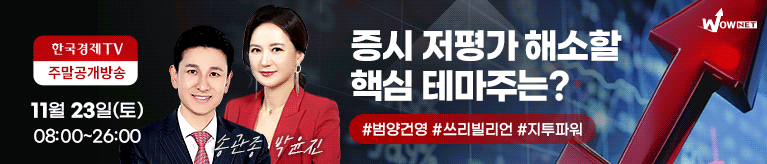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뚫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올랐으니, 실질적으로 우리 월급은 준 것이다. 수치를 통하지 않더라도 매일이 물가 폭탄의 경험이다.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이런 와중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뚫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올랐으니, 실질적으로 우리 월급은 준 것이다. 수치를 통하지 않더라도 매일이 물가 폭탄의 경험이다.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이런 와중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자 은행들은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의 관치금융 때문에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하며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금리의 차이)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출금리 인하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의문시된다.
은행들이 대출을 내주고 받는 이자수익과 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재무제표의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면, 그 실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작년 말 대출 규모가 300조원에 이르는 국내 대형 S은행의 올 1분기 이자수익은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자비용은 겨우 8500억원이다. 대출로 얻은 이자수익 중 34%만 예금이자로 지급한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30% 내외로 비슷하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시가총액 1위의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도 원가율이 60%인 것을 고려하면 국내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S은행과 W은행은 1분기 말 대출금 전액의 98%를 예금으로 조달했다. 그렇게 조달한 자금을 운용한 결과 S은행의 경우 1분기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연 단위로 환산해보면 평균 대출이자는 3.28%를 받고 예금이자는 1.04%만 지급했다. 국민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국민에게 대출해서 2.24%포인트의 중간이득을 얻은 것이다. 4월 말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이 2.35%포인트로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 위의 계산이 허수는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예대마진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성장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쉬운 돈벌이에 집착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S은행의 1분기 이자수익은 전체 수익의 83.4%로, 수익 대부분이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수익구조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미국 대형 A은행의 사례를 보면 수익구조가 전혀 다르다. 1분기 말 이자수익이 128억9400만달러인데, 그 이외 수익도 122억2300만달러다. 유수의 해외 은행은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다양한 이익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의 손익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S은행은 1분기 일반관리비가 순이자이익의 43%이며, 작년에는 절반이 넘는 51%였다. W은행은 더욱 높아 1분기에 49%, 작년에는 61%를 넘었다. 일반관리비의 60% 이상이 임직원의 급료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이자수익에서의 일반관리비 지출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은행의 이사회는 높은 예대마진으로 거둔 막대한 이익의 방만한 일반관리비 지출을 억제하고, 그 자금을 투자나 대출금리 인하 또는 예금이자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출의 원천이 일반 국민의 예금이므로 은행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따라서 은행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대출금리와 예금이자가 연계되도록 공정금리제도를 도입하고, 이자수익에서의 일반관리비 지출을 제한하는 성과보상제도를 제안한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해 5년간 잔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은행들의 잔치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