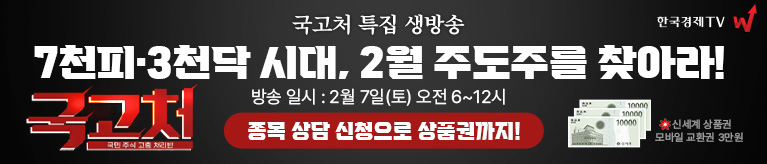이게 끝이 아니다. 투자 여건이 바뀌어 당초 사전 신고 때 밝힌 금액보다 투자액이 줄어들면 ‘변경 보고’를 해야 하고, 투자액을 늘리는 경우엔 ‘사전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투자금 마련에 쓴 대출금리가 바뀔 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 회사 담당 임원은 “전담 인력이 있는 대기업도 외환 신고가 복잡해 힘들다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구시대적이란 지적이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워낙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외국환거래법엔 ‘범법자 양산법’이란 오명이 붙었을 정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2020년 전체 자본거래 위반 적발 건수(6021건) 중 56.4%인 3395건이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었다. 여러 신고 중 일부를 누락했거나 보고 시점을 놓친 경우가 많았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