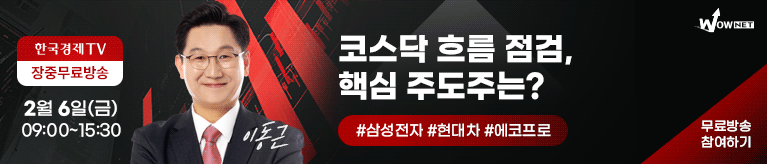자연이 만들어내는 ‘찰나의 시간’으로 인간의 영혼을 포착할 수 있을까.
자연이 만들어내는 ‘찰나의 시간’으로 인간의 영혼을 포착할 수 있을까.예술영화 감독 민병훈(53)은 수년간 제주를 거닐며 이 물음의 답을 찾았다. 산과 바다, 숲과 돌이 지닌 순수한 조형성을 카메라에 담은뒤, 날씨와 계절의 변화로 다양하게 변주했다. 눈 쌓인 제주의 숲과 푸른 바다의 이미지, 해 질 녘의 노을과 새벽녘의 안개는 현실과 환상의 벽을 넘나드는 미디어아트로 진화했다. 눈 쌓인 한라산에서 사흘 넘게 촬영하고, 해 질 녘의 구름을 담기 위해 몇 번이고 산을 오르기도 했다.
두 번째 미디어아트 개인전 ‘I AM’을 부산 해운대 뮤지엄원에서 열고 있는 민 감독은 “자연에는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혼’을 자연의 찰나적 시간으로 이미지화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에게 각자의 고결함을 깨우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은 모두 제주 곳곳을 돌아다닌 여정의 결과물이다.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자연의 이미지가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분명 익숙한 자연의 이미지들인데 영화의 문법으로 비틀듯 새로운 관점을 선사한다. 8~9분 안팎의 단편 작품들은 ‘영혼’ ‘구원’ ‘고백’ ‘축복’(사진) ‘신에게 솔직히’ 등의 제목이 달렸다. 82분 분량의 ‘하나의 존재’는 자신의 사유를 영화 형식에 녹여내는 ‘시적 필름’의 대표적 사례로 읽을 수 있다.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철학이 집약된 작품 사이를 걷다 보면 자연 속 일부가 된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된다.
러시아국립영화대를 졸업한 민 감독은 ‘벌이 날다’(1998) ‘괜찮아 울지마’(2001) ‘포도나무를 베어라’(2006)로 토리노국제영화제 대상, 코트부스국제영화제 예술공헌상,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비평가상, 테살로니키국제영화제 은상 등을 수상했다. 세계 각국의 예술영화제에 초청받아온 그는 생명에 관한 장편 3부작 ‘황제’ ‘기적’ ‘팬텀’ 등을 통해 피아니스트 김선욱 등 아티스트와도 협업하며 영화와 다큐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올초 서울 청담동 호리아트스페이스에서 연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미디어아티스트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전시는 7월 10일까지.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