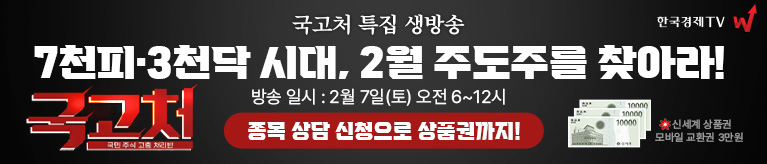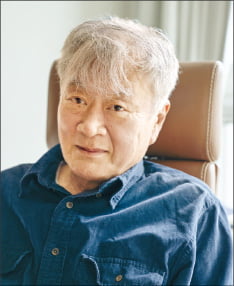 죽음을 앞둔 늙은 수녀는 밤마다 몰래 방을 나선다. 자다가 지린 대소변이 묻은 속옷을 세탁하기 위해서다. 호스피스 수도원에 세탁부가 있지만, 자신의 절망을 혼자 감당하는 게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 듯하다. 어느 밤, 빨래를 하고 병실로 돌아오던 그는 텅 빈 복도 바닥에 쓰러져 죽음을 맞는다. 나환자촌에서 숱한 환자와 지냈지만 죽음은 동행하지 못했듯이, ‘저만치 혼자서’ 생을 마친다.
죽음을 앞둔 늙은 수녀는 밤마다 몰래 방을 나선다. 자다가 지린 대소변이 묻은 속옷을 세탁하기 위해서다. 호스피스 수도원에 세탁부가 있지만, 자신의 절망을 혼자 감당하는 게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 듯하다. 어느 밤, 빨래를 하고 병실로 돌아오던 그는 텅 빈 복도 바닥에 쓰러져 죽음을 맞는다. 나환자촌에서 숱한 환자와 지냈지만 죽음은 동행하지 못했듯이, ‘저만치 혼자서’ 생을 마친다.작가 김훈(사진)이 최근 출간한 단편소설집 《저만치 혼자서》의 표제작 내용이다. 누구도 함께 나눠가질 수 없는 죽음의 무게처럼 이 책에 수록된 소설 일곱 편에는 저마다의 절망을 각자의 방식으로 감당하는 인물들이 나온다. 성폭행범 아들을 둔 어머니는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러 길을 떠나고(‘손’), 6·25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는 북한군과 남한군이 뒤섞인 뼛조각을 발라내는 일을 거부한다(‘48GOP’). 작가는 냉정할 정도로 담담한 문장과 집요한 묘사로 현실의 누추함과 인간의 고통을 그려낸다.
 김 작가는 5일 서면 인터뷰에서 “인간의 고통을 개념적이나 수량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며 “구체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작가에게 인간의 고통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그는 “동네 거리에서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떠나는 사태를 보면서 현실의 무자비한 작동 방식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5일 서면 인터뷰에서 “인간의 고통을 개념적이나 수량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며 “구체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작가에게 인간의 고통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그는 “동네 거리에서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떠나는 사태를 보면서 현실의 무자비한 작동 방식을 알았다”고 설명했다.이 책은 첫 소설집 《강산무진》 이후 16년 만에 출간한 단편소설집이다. 작가는 “16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흘러간 것”이라며 “지나간 것들은 별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아침에 무슨 문장을 쓰느냐, 이것만이 문제”라며 “쓸 때마다 늘 새로운 지옥이 다가온다”고 털어놨다.
그런 그가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은 ‘손’에 있다. 김 작가는 여전히 연필을 깎아 원고지에 글을 새긴다. 그는 “연필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삶의 방식일 뿐”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방식 안에 삶에 대한 직접성이 살아있고, 이 느낌이 없으면 글을 끌고 나갈 수 없다”고 했다.
김 작가는 “소설은 ‘만들다(make)’를 통해서 ‘되다(become)’로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본질적으로 소설은 허구지만 작가는 소설 속 인물이 돼 삶의 진실을 말하게 된다. 그는 “‘만들기’는 손의 일이고 ‘되기’는 마음의 일이지만, 손과 마음은 연결돼 있다”고 했다.
이번 단편소설집을 엮은 기준에 대해서는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 같은 글은 모두 버렸다”고 했다. 그는 “에세이를 자주 쓰다 보니 생각과 문장을 에세이식으로 전개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이어 “소설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말해야 하는데, 내가 직접 나서서 말하게 된다”며 “그건 좋지 않다”고 했다.
김훈의 연필은 이후 어떤 소설로 뻗어나갈까. 그는 차기작에 대해 “생명의 본능으로 절망에 맞서는 한 청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