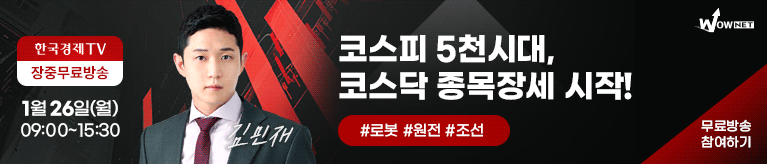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진)는 지난 27일 지평이 ‘그린워싱 리스크와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과거엔 정부와 시민단체, 일부 소비자 정도가 지적했던 그린 워싱 문제 제기가 이제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인플루언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으로도 이뤄지고 있다”며 “그린 워싱으로 지적받는 유형도 훨씬 다양해졌고 그린 워싱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과 기업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로열더치셸은 식수(植樹) 사업으로 탄소를 흡수한다는 광고를 냈다가 네덜란드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석유를 쓰면서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진)는 지난 27일 지평이 ‘그린워싱 리스크와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과거엔 정부와 시민단체, 일부 소비자 정도가 지적했던 그린 워싱 문제 제기가 이제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인플루언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으로도 이뤄지고 있다”며 “그린 워싱으로 지적받는 유형도 훨씬 다양해졌고 그린 워싱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과 기업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로열더치셸은 식수(植樹) 사업으로 탄소를 흡수한다는 광고를 냈다가 네덜란드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석유를 쓰면서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자본시장에서도 그린 워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영국의 기후 관련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은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발간해 “세계에서 총자산 3300억달러 이상인 130개 기후 테마펀드 중 72개의 투자대상이 파리기후협약 목표와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지난해 한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석탄 관련 자산에 최소 85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 변호사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의 미비,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 등으로 그린 워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유럽연합 등 세계 각지에선 ESG 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도 깐깐하게 만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린 워싱으로 정부로부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시정 조치나 과징금, 벌칙 등의 제재를 받을 위험도 커졌다.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허위로 광고했던 아우디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한 자동차가 고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했고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유로5)에도 맞는다는 광고를 했다. 하지만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시켰을 뿐 평소엔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회사는 2016년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받았다.
경쟁사가 그린 워싱을 지적해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소재기업인 알칸타라는 지난해 같은 소재기업인 미코를 상대로 극세사 제품을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미코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극세사’, ‘100% 재활용이 가능한 극세사’ 등의 표현을 쓰며 자사 제품을 광고해왔다. 장품 지평 변호사는 “이제는 일반 소비자와 경쟁사까지 적극적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비자가 친환경 내용이 담긴 마케팅을 오인하지 않도록 기업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