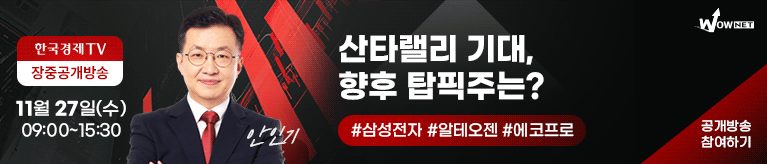지난 5월 10일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역대 대통령과 뚜렷이 대비된다. 일단 분량이 적다. 전체 3303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8969자), 박근혜 전 대통령(5558자)에 비해 매우 짧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럽게 실시된 대선으로 선거 다음날 약식 취임식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3181자)과 비슷하다.
연설문 구성도 다른 대통령과 다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보통 경제·사회·외교·안보·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자유’를 강조하는데 치중했다. 약 16분 간의 연설에서 자유가 35번이나 등장했다. 분야별로는 대강의 성장 전략과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향후 5년 간 국정과 정치철학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도만 뚜렷하게 보여주고 세세한 정책은 이런 자유의 가치에 기반해 펼쳐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유 강조는 문재인 정권과 뚜렷이 대비된다. 헌법의 골격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법, 언론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등 반시장, 반자유, 위헌적 입법을 밀어붙인 것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한 것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과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국내외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 고(高)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무역 환경이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도 눈앞에 닥친 폭풍우다.
이런 당면 과제 이외에 무엇보다 여소야대 정국이 최대 난관이다. 윤 대통령의 유능한 정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잘 알려진대로 검찰에서만 잔뼈가 굵었다. 그의 몸에 밴 검찰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대선판에 뛰어들었을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검찰 리더십은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함 속에서 발휘되는 직선적인 성격이 강하다. 반면 정치 리더십은 다면적 예술이다. 때론 대쪽이 필요하지만, 감성적인 유연함도 갖춰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런점에서 흡수력이 빨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판 진흙탕에 뛰어들어 불과 8개월만에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이라지만 국회의 힘 매우 강력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헤쳐나가야 할 난관은 대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험난하다. 대선 땐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외길만 걸으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 뒤에 국민이 있고,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가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은 진흙탕에 빠질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국회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거대한 성벽과도 같다. 대통령이 정책 하나라도 실현하려면 대부분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한다.그러나 거대 야당이 깔아뭉개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시절 ‘징벌적’이라고 평가받은 부동산 세제를 고치려고 해도 민주당이 ‘노(No)’하면 어렵다. ‘탈(脫)탈원전’ 정책을 실행하려고 할 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건 반대한다. 그러면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연계 전략을 펴면 난관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승리 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마주한 상황과 비슷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이 추진하던 법안들이 과반(273석 중 151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등 야당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자 “힘들어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고 푸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야당과의 타협보다 정면 대결로 나갔다.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탄핵을 당했고, 여소야대라는 정치판을 뒤집었다. 하지만 임기 내내 여야 간 첨예한 대결은 끝이 없었고,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미 민주당은 대선 직후부터 사사건건 제동을 걸면서 완력을 자랑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국민의힘은 제대로 ’반항’ 한 번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졌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합의도 번복하려 하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 직전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차지하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틀어쥐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무기로 다른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채 반쪽 출발했다.
이 모든 것은 전조에 불과하다. 향후 수 많은 일들이 민주당 문턱에 가로막힐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까지 국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만약 이 고문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당 대표에 취임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주의 강조는 ‘여소야대’ 현실 감안한 것
윤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짜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원칙없는 통합과 협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훼손된 자유시장경제, 법치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보다 정교한 대야(對野)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대로 때론 사자의 심장, 때론 여우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은 긍정평가 받을만하다는 지적이다. 연금·노동·교육 등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의회주의를 강조했고, 주요 사안에 대해 의회 지도자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으며, 본회의장을 돌며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한 것은 ‘여소야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고 꼬인 실타래가 단번에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의 다음 수는 뭘까.
홍영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