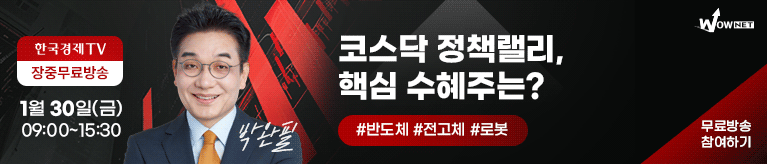마스터스 토너먼트에 20번 참가해 두 차례 준우승을 차지한 데이비드 러브 3세(58)는 오거스타내셔널GC에 대해 “골프대회가 열리는 구장 중 그린이 가장 까다로운 곳”이라며 이같이 말한 적이 있다. 오거스타GC를 전 세계 골퍼들의 버킷리스트로 만든 것은 신비주의뿐만이 아니다. 홀마다 개성이 뚜렷하기에 매 홀 다양한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며 골퍼들의 도전욕구와 정복욕을 자극한다.
오거스타GC는 ‘골프 성인’ 보비 존스(1902~1971)의 의뢰로 앨리스터 매킨지(1870~1934)가 설계했다. 오거스타GC를 비롯해 사이프러스 포인트·로열 멜버른 등 세계 최고의 코스가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장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의 리뉴얼도 그의 작품이었다. 이 같은 업적을 인정받아 코스 설계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매킨지 이전의 골프 코스는 대부분 ‘벌칙형’이었다. 그린으로 향하는 길은 단 하나의 정답만이 있었고 그 정해진 답을 맞히는 샷을 해야 했다. 하지만 매킨지는 벌칙보다 ‘전략’을 주목했다. “홀마다 다른 클럽을 쓰면서 다른 거리의 샷 공략이 가능해야 한다”며 페어웨이, 벙커, 나무 등 코스를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에 다양한 변수를 담아 골퍼가 매번 상상력을 발휘해 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대자연이 살아 숨 쉬는 오거스타GC 곳곳에는 매킨지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는 자신의 책 《골프코스 설계학》에서 “코스는 아름다운 환경을 가져야 하고, 모든 인위적인 지형은 누가 봐도 자연 지형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형태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무 등 지형지물을 코스 구성 요소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그래서다. 오거스타GC에서는 울창한 나무가 그린을 방어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조용히 골프를 즐기고 싶어 ‘은밀한 장소’를 원했던 존스에게 안성맞춤이었다.
그린에 언듈레이션, 즉 경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 역시 매킨지가 시초다. 조희찬 기자가 보기플레이로 선방한 1번홀 그린은 왕관을 쓴 듯 가운데가 높고 좌우는 낮다. 한국에선 이른바 ‘솥뚜껑 그린’으로 불리는 형태다. 그린 입구는 파도처럼 땅이 일렁이며 발판 역할을 한다. 한국 골퍼에게도 익숙한 ‘계단형’ 그린도 오거스타GC 9번홀(파4)에 있다.
5번홀(파4) 그린은 페어웨이에서 가파르게 치솟아 왼쪽이 높게 올라간 형태다. 뒤편에는 부드러운 경사가 페어웨이까지 대각선을 이룬다. 타이거 우즈는 올해 이 홀에서 투어 첫 4퍼트를 기록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