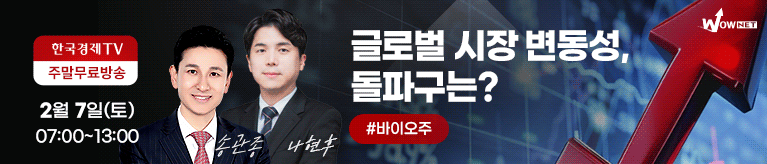아이의 40대 아빠가 뾰로통하게 물었다.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속 아바타의 옷값을 사느라 40만원을 쓰는 게 말이 되냐”고. 초등 6학년생 아이가 답했다. “나이키 운동화 안 사줘도 돼요. 아바타가 예뻐야 애들한테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비와 사치는 경계가 명확했다. 소비는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등장과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대유행)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황지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마케팅학과 교수는 “소비에 관한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뒤흔들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소비와 ‘인스타 사진’이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신(新)소비 인류의 시대”라고 입을 모은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1.4%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꾸준히 늘렸다는 얘기다.
하물며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 어떻게 될까. 유통업계에선 3년 가까이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본격적으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황에 따른 소비 폭발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보복성 소비가 전방위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명품 시장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는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지난달 말부터 샤넬 등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매출이 되레 떨어지고 있다”며 “주머니가 얇은 2030세대들의 소비가 명품에서 여행, 모임 등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진 돈을 몰아넣는 선택적인 소비가 강해질수록 소비자들은 ‘나만의 소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소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식 있는 소비자’의 등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SNS에서 흔한 말로 정착된 ‘돈쭐낸다’는 행위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신소비 인류의 특징으로 분류된다. MZ세대가 남들과 다른 희귀 브랜드를 찾아다니는 덕분에 ‘구멍가게’ 규모에 불과한 토종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대기업 제품과 당당히 겨루고 있는 것이 그런 사례다. 거액 자산가들은 ‘에(에르메스)·루(루이비통)·샤(샤넬)’ 등 전통적인 명품에서 벗어나 초고가 가구나 침대 등 리빙 명품에 지갑을 활짝 열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