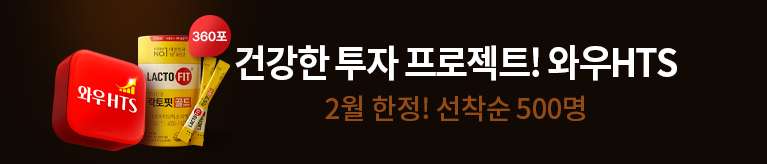‘배아 단계’의 아이디어가 묵살된 사례는 비단 레이더뿐만이 아니다. 수륙양용 트럭을 포함한 많은 무기도 마찬가지였다. 혁신 초기의 아이디어는 허점투성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만연한다. 노키아 직원들이 발견했던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아이디어는 경영진이 코웃음치며 묻어버렸고, 의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머크 역시 유전공학 기술을 우습게 여겼다가 업계 판도가 바뀌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흔히 기업의 이 같은 실책을 두고 대기업은 보수적이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스타트업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어서 흥미진진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던 직원이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면 과격한 아이디어를 옹호하고 설득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변한다. 분명 ‘똑같은’ 사람이 맥락에 따라 보수주의자가 되기도, 혁신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문화가 아닌 구조의 문제
물리학자인 사피 바칼은 그의 책 《룬샷》을 통해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 변화를 상전이 현상으로 설명한다. 얼음덩어리 위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바로 얼어붙지만, 똑같은 물 한 방울을 수영장에 떨어뜨리면 다른 물과 섞여버린다. 물리학자 필립 앤더슨이 ‘많으면 달라진다’라고 표현한 것도 이 부분이다. 그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부분의 합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액체의 유동성과 고체의 딱딱함뿐만 아니라 금속 내 전자의 독특한 행동을 설명했다. 물 분자 하나만 분석해서는 전체 집합적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변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분자 하나가 애를 쓴다고 주변 분자가 얼어붙는 것을 막을 순 없음을 의미한다.바칼은 모든 상태는 결합하려는 힘과 무질서를 지향하는 힘 간의 대결로 정해진다고 설명한다. 즉, 온도가 내려가면 결합에너지는 강해지고 무질서의 힘은 약해진다. 어느 순간 이 두 힘의 크기가 역전될 때 물이 얼어붙는다. 즉, 시스템이 전환되는 것이다. 조직에서도 이런 두 힘이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벌인다. 돈과 지위가 대표적이다. 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는 집단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누구에게나 큰 ‘판돈’이 걸려 있다. 작은 바이오테크 회사에서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모두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실패하면 실업자 신세에 처할 위험도 높다. 이렇게 큰 판돈에 비하면 승진 등으로 표현되는 지위에 따른 특전은 미미해 보인다. 반면 회사 규모가 커지면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판돈’은 줄어드는 반면 ‘지위’에 따른 특전이 커진다. 두 조건의 크기가 역전될 때 시스템이 전환된다. 조직이 커지고 안정될수록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동일한 집단임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퇴짜 놓는 이유다.
혁신보다 설계가 중요
 물에서 딱딱한 얼음으로 변하는 상전이 현상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현 상태가 액체인지, 고체인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이 가득 찬 커다란 욕조의 표면을 망치로 내려칠 경우 물이 튀면서 망치가 액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지만, 같은 물을 얼린 다음 내려치면 표면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오늘날 많은 리더가 혁신을 강조한다. 자랑스럽게 조직도에 박스를 하나 더 그려넣고, 새 건물을 임차해 혁신연구소 간판을 내건다. 하지만 온도가 떨어지는데, 분자 하나가 절박하게 애쓴다고 해서 주변이 얼음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는점을 낮출 순 있다. 눈이 오는 날 소금을 뿌리면 눈이 딱딱한 얼음이 되기 전에 녹도록 만들 수 있다. 즉, 구조의 작은 변화를 통해 조직의 경직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것이 변화하는 시기다. 혁신의 핵심은 문화나 새로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조와 그 설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물에서 딱딱한 얼음으로 변하는 상전이 현상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현 상태가 액체인지, 고체인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이 가득 찬 커다란 욕조의 표면을 망치로 내려칠 경우 물이 튀면서 망치가 액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지만, 같은 물을 얼린 다음 내려치면 표면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오늘날 많은 리더가 혁신을 강조한다. 자랑스럽게 조직도에 박스를 하나 더 그려넣고, 새 건물을 임차해 혁신연구소 간판을 내건다. 하지만 온도가 떨어지는데, 분자 하나가 절박하게 애쓴다고 해서 주변이 얼음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는점을 낮출 순 있다. 눈이 오는 날 소금을 뿌리면 눈이 딱딱한 얼음이 되기 전에 녹도록 만들 수 있다. 즉, 구조의 작은 변화를 통해 조직의 경직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것이 변화하는 시기다. 혁신의 핵심은 문화나 새로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조와 그 설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