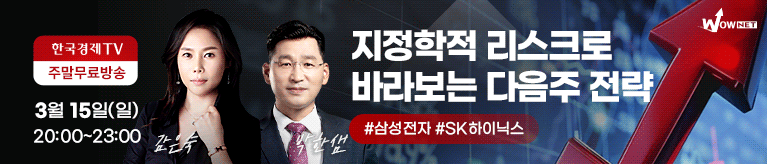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GC는 20m 높이의 소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다. 골프장을 도심과 분리하는 이 ‘소나무 벽’은 골프장 안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소나무들은 홀과 홀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세계 최고 골퍼들의 고개를 떨구게 하는 함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거스타의 악명 높은 소나무도 ‘돌아온 골프 황제’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7일(현지시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509일 만에 복귀전을 치른 타이거 우즈(47·미국)는 소나무 숲에 공을 세 번이나 떨궜지만, 전성기 시절을 방불케 하는 절묘한 샷으로 모두 한 번에 빠져나왔다. 우즈는 이날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로 공동 10위에 올랐다.
“치열한 경쟁에 아드레날린 솟아”
이날 우즈는 작년 2월 교통사고로 두 다리 뼈가 산산조각나고, 불과 6개월 전까지 목발을 짚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페어웨이 안착률(57%)과 그린적중률(50%)은 높지 않았지만, 귀신 같은 쇼트게임으로 파를 지켰다. 여기에 황제다운 위기관리 능력이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짧았던 드라이버 샷 거리(평균 288.3야드)를 메웠다.우즈는 “예상대로 아팠고 걷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해온 체력 훈련 덕분에 지치지 않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아드레날린이 솟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을 보내야 할 곳에 보냈다”며 “(언더파를 상징하는) 빨간 스코어를 적어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즈의 샷을 지켜본 상당수 전문가의 반응은 “출전 자체에 의의를 둔다”에서 “우승 가능성이 있다”로 바뀌었다. 이날 성적이 우즈가 과거 다섯 차례 마스터스를 우승했을 때 1라운드 평균 타수(70.8타)와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 우즈는 그동안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타수를 줄이는 모습을 오거스타GC에서 보였다.
우즈는 이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움켜쥐었다. 6번홀(파3)에선 공을 홀 60㎝ 지점에 떨군 뒤 버디로 연결했다.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8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주변에 보내고도 4타를 더 쳐 보기를 적어냈다. 우즈는 “집중력이 부족해 세 번의 안 좋은 샷이 연속으로 나왔다”며 “아직 (우승까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매일 얼어 죽기 직전까지 얼음찜질”
이날 1번홀 티박스는 우즈의 복귀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4만여 패트론(갤러리)으로 둘러싸였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18홀까지 우즈를 따라다녔다. 우즈가 잘 치건, 못 치건 ‘타이거’를 외쳤다. 오거스타내셔널GC 회원인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제리 양 야후 설립자, 미국프로풋볼리그(NFL) 로저 구델 커미셔너도 우즈를 보기 위해 코스를 찾았다.경기 뒤 퉁퉁 부은 다리로 마이크 앞에 선 우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회복 과정을 일부 공개했다. 우즈는 “부기를 빼기 위해 매일 얼음찜질하고 얼음목욕을 한다”며 “한마디로 얼어 죽을 만큼 얼음찜질을 한다”고 했다. 우즈는 이날 경기 후 연습은 건너뛰었다.
오거스타(미국 조지아)=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