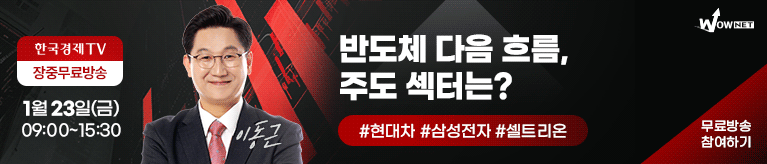그가 집권 과정에서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또다시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비민주적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을 남긴 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다. ‘서울의 봄’을 짓밟고, 민주화 인사를 탄압한 것도 마찬가지다. 재임 중 기업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정경유착 오점을 남긴 것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다. 퇴임 후 법원에서 반란·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김영삼 정부에서 사면받았지만 끝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그의 삶과 80년대라는 시대 자체가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될 현대사의 타산지석이자 반면교사인 셈이다.
그러나 완전히 어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임기간 중 연평균 10.2%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이뤄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IT강국 토대를 마련하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7년 단임 약속을 지킨 것 등은 평가할 만하다. 고속 경제성장은 세계적인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덕을 본 것이지만 이로 인해 중산층이 두터워졌고,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듯 역설적으로 민주화를 앞당긴 요인이 됐다.
이렇듯 어느 시대나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역대 정부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데, 정치 유불리나 편견에 갇혀 오로지 한 가지 잣대로 선과 악으로 갈라선 발전할 수 없다. 공은 공대로 기억하고, 과는 과대로 경계하며 긴 호흡으로 역사를 관조해야 그 시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철권통치를 종식시켰지만, 그 이후 한 세대 넘게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과연 제대로 뿌리내렸는지 자문해볼 필요도 있다. 그의 죽음으로 갈등과 대립, 적폐와 오점을 남긴 5공화국은 역사의 평가로 넘기게 됐다.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로 거듭날 때라야 비로소 그 시대를 청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