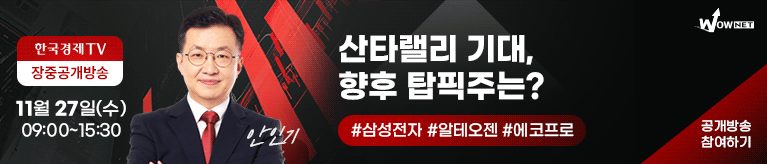출판과 관련한 동아시아 국제포럼과 학술대회에 참가하다 보면 이웃 국가들에 대해 종종 생각하게 된다. 일본 중국 대만의 발표 내용과 태도가 제각기 다르고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이 중 한국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태도와 정서를 보여주는 나라는 대만이다. 이번에도 그 점을 여실히 느꼈다. 중국과 일본은 출판을 보는 관점과 내세우고 싶은 주장이 우리와 확연히 다른 데 비해 대만은 처한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 왜 이럴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출판과 관련한 동아시아 국제포럼과 학술대회에 참가하다 보면 이웃 국가들에 대해 종종 생각하게 된다. 일본 중국 대만의 발표 내용과 태도가 제각기 다르고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이 중 한국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태도와 정서를 보여주는 나라는 대만이다. 이번에도 그 점을 여실히 느꼈다. 중국과 일본은 출판을 보는 관점과 내세우고 싶은 주장이 우리와 확연히 다른 데 비해 대만은 처한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 왜 이럴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먼저 중국과 일본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자. 중국은 출판사가 모두 국영기업이다. 출판사 직원들은 공무원이며 공산당에 소속돼야 진급도 빠르다. 그들의 해외 포럼 참가는 자신의 국가와 회사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발언의 제한이 많다. 듣고 있으면 과장도 심하고 자국 중심적이다.
일본은 사안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판 동향을 분석한 글에서 일본의 발표자는 ‘감시국가’라는 문제를 가장 크게 내세웠다. 방역당국이 휴대폰 같은 개인 미디어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의 끔찍함에 대해 일본인은 매우 큰 불안과 깊은 황폐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 대만은 감시사회 같은 주제는 거의 거론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출판의 산업적인 타격, 사람들이 입는 마음의 상처를 더 심각하게 고려한다. 나오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도 비슷한 종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뉴미디어의 진화가 일본 중국에 비해 앞서 있어 출판이 그런 것들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다.
요약하자면 중국은 출판의 방향이나 매출 같은 것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의 영역 확장에 관심이 많고, 일본은 변화에 저항하면서 출판의 전통적인 가치를 꼿꼿이 지켜가려는 방어적 태도가 두드러진다. 한국과 대만의 출판은 중국과 일본의 그것에 비해 뿌리가 약하다. 소규모 민간 자본이 주도해 책을 내지만 출판이 자본의 거센 바람에 있는 대로 노출돼 거칠고 힘들게 자라고 있다는 걸 하소연한다. 그래서 행사가 진행될수록 대만과의 동질감이 짙게 느껴진다. 미·중 두 강대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 낀 상황이나 식민지를 겪으며 민주사회로 성장해온 역사가 비슷하다는 것도 두 나라의 정서적 유사성과 유대감을 높여놨으리라.
동아시아 4국의 출판 교류는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그리게 한다. 거대한 자본으로 콘텐츠를 대량 생산하는 중국을 통해서는 우리가 곶감 빼먹듯 얻을 것을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전통이 깊은 일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다. 대만과는 비슷한 조건에서 누가 더 잘 버텨내고 진화하느냐 하는 비교와 경쟁의 관계가 된다. 동질감을 느끼는 쪽이 경쟁 관계가 되는 묘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