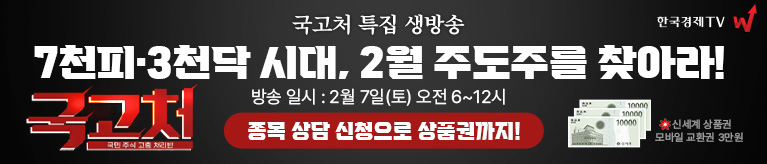대표적인 일본 TV 드라마 중에 <한자와 나오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13년 방영된 시즌1의 최종화는 42%, 2020년 방영된 시즌2의 최종화는 32%라는 전무후무한 시청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 이후 합병을 통해 탄생한 가상의 은행인 도쿄중앙은행에 다니는 한자와 나오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일본 TV 드라마 중에 <한자와 나오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13년 방영된 시즌1의 최종화는 42%, 2020년 방영된 시즌2의 최종화는 32%라는 전무후무한 시청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 이후 합병을 통해 탄생한 가상의 은행인 도쿄중앙은행에 다니는 한자와 나오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주목할 것은 버블 붕괴 직후가 무대인 시즌 1의 경우 주인공이 아직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은행 내부의 부조리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 반면, 시즌 2는 계열 증권사의 임원이 되어 M&A 거래와 항공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금융의 핵심이 '대출'에서 'M&A'와 '구조조정'으로 변했던 일본 금융계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이죠.
그런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합니다. 이른바 IMF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에서 은행의 역할은 축소되고 대신 증권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목격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사의 시대는 얼마 가지 못했고, 2013년 이후부터는 사모펀드들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의 총아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내 M&A 시장의 규모와 사모펀드들의 비중 변화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M&A 시장은 연 10조~25조를 사이에서 움직였고, 사모펀드는 평균적으로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이후부터 M&A 시장이 20조~40조 규모로 성장함과 동시에 사모펀드들의 비중도 50% 내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조 단위의 거래 몇 개씩을 사모펀드들이 수행하자, 금융계의 중심이 사모펀드로 급격히 옮겨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뉴스에서 사모펀드들의 M&A 소식을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이나 브랜드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IMF 금융 위기 직후 외국계가 주도했던 ‘1차 사모펀드 전성기’에 빗대어, ‘2차 사모펀드 전성기’가 왔다는 공감대가 금융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그 즈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팬데믹 상황은 이런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듯 합니다. M&A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대형 사모펀드들의 투자가 주춤한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른바 성장 산업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른바 '빅테크'라 불리는 해당 산업 분야의 주요 사업자들과 그들에게 투자를 해주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들로 관심이 옮겨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팬데믹 상황은 이런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듯 합니다. M&A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대형 사모펀드들의 투자가 주춤한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른바 성장 산업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른바 '빅테크'라 불리는 해당 산업 분야의 주요 사업자들과 그들에게 투자를 해주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들로 관심이 옮겨 간 것입니다.이런 상황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올해 초 쿠팡의 성공적인 미국 증시 입성이었습니다. 그 전후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이 되는 기업들이 속출했고,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이 이어졌습니다. 비젼 펀드 등 대형 벤쳐 펀드들을 위시하여 외국계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의 국내 빅테크 투자도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오래된 업력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사모펀드들은 무대 중앙에서 다소 멀어졌습니다. 게다가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는 대기업들이 대형 M&A 거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사모펀드의 존재감은 과거와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아직은 이를 수 있지만, 10여년을 이어온 ‘2차 사모펀드의 전성기’가 끝나는 듯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문 인력의 이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융 관련 전문직 중에서는 사모펀드는 항상 최고로 각광을 받아왔고, 한번 업계에 들어오면 다른 업계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사모펀드를 떠나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성장하는 벤쳐 기업에 취업하는 이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그리 놀랍지 않은 것은 선진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들은 ‘역할과 위상은 크지만, 큰 화제가 되지는 않는 존재들’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멀리는 1998년 IMF 금융위기, 가까이는 2004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설립이 허용된 이후 시작된 우리나라 사모펀드 업계도,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그리 놀랍지 않은 것은 선진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들은 ‘역할과 위상은 크지만, 큰 화제가 되지는 않는 존재들’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멀리는 1998년 IMF 금융위기, 가까이는 2004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설립이 허용된 이후 시작된 우리나라 사모펀드 업계도,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성숙기라고 해봤자 사람으로 치면 20대 한창 나이가 되는 것이니,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아쉬워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여전히 성장하는 매력적인 업종임에는 변함이 없고, 팬데믹 위기가 지나면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