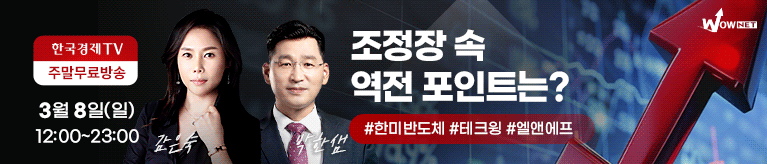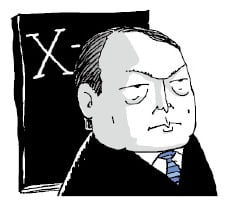 영어 단어 중 가장 숫자가 적은 게 알파벳 X, Y, Z으로 시작하는 단어다. 그중에서도 X로 시작하는 단어가 제일 드물다. 프랑스 수학자 겸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1596~1650)는 수학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표현할 때 알파벳 X를 맨 먼저 썼다. 그 뒤부터 X는 ‘확인 불가한 존재’의 대명사가 됐다. 정체를 모르는 광선을 X레이, 정체불명의 여성을 마담X, 공개되지 않은 코카콜라 제조공식은 ‘머천다이즈 7X’로 표현하는 식이다.
영어 단어 중 가장 숫자가 적은 게 알파벳 X, Y, Z으로 시작하는 단어다. 그중에서도 X로 시작하는 단어가 제일 드물다. 프랑스 수학자 겸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1596~1650)는 수학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표현할 때 알파벳 X를 맨 먼저 썼다. 그 뒤부터 X는 ‘확인 불가한 존재’의 대명사가 됐다. 정체를 모르는 광선을 X레이, 정체불명의 여성을 마담X, 공개되지 않은 코카콜라 제조공식은 ‘머천다이즈 7X’로 표현하는 식이다.‘X파일’도 존재 여부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인물에 관한 문서를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흔히 쓰이게 된 것은 1994년 동명의 미국 드라마가 수입되면서부터다. 시즌 11까지 방영된 ‘X파일’은 외계인, 미확인비행물체(UFO), 초자연적 현상 등을 다루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 들어 ‘삼성 X파일’ ‘연예계 X파일’ 등처럼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폭로 사건들이 이어지며 단어 쓰임새가 더 넓어졌다. 외래어가 고유명사처럼 퍼지자 2005년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이 여론 투표에 부쳐 ‘안개문서’를 X파일의 대체어로 정하기도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검찰총장을 향해 처와 장모 관련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해왔다. 최근엔 당 대표까지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말해 의혹을 키웠다. 이 파일을 본 한 정치평론가가 “이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힘들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치권에서 X파일 등을 내세운 음모론의 뿌리는 깊다. 2002년 16대 대선 때는 병역브로커 김대업 씨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나중에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이 후보는 결정타를 입고 낙선한 뒤였다.
야당은 윤석열 X파일이 있다면 공개부터 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가 윤 전 총장을 검찰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쳤을 텐데 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X파일에 대해 일절 함구다. “어떻게든 의혹을 부풀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김대업 시즌2’의 냄새가 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 정치는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박수진 논설위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