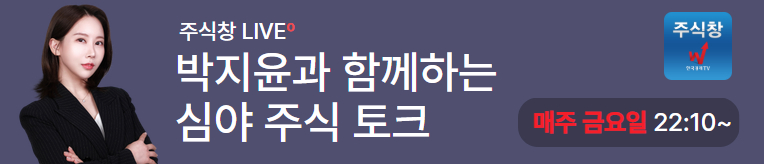B사는 해당 땅 중 일부를 2013∼2014년 사들였는데, 땅에 분묘가 있는 것을 보고 “분묘를 철거하라”며 A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분묘 사용료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A종중은 “분묘를 설치한 땅을 팔면서 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며 “묘를 쓸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A종중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B사의 분묘 철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자들과 종중 간 매매 계약에서 이장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어 A종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종중이 분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판단했다. 땅 주인 허락 없이 분묘를 관리해도 20년 이상 별 일 없었다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건 역시 이장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 생기는 분묘기지권과 달리 소유권 이전 당시 이전 약속을 하지 않아 생긴 분묘기지권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분묘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