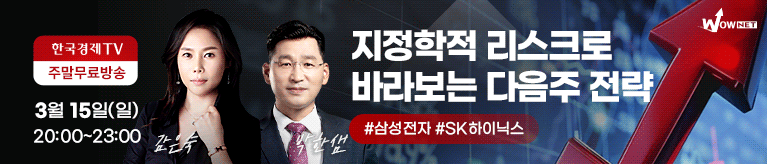한국은행이 최근 불어난 가계부채가 가계 씀씀이를 옥죄는 등 경제성장률을 갉아 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름세를 보이는 미국 시장금리로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가계부채 부작용과 외국인 투자금 유출을 우려하는 방식으로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고위임원이 이날 "기준금리를 한 두번 올리는 것이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이 최근 불어난 가계부채가 가계 씀씀이를 옥죄는 등 경제성장률을 갉아 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름세를 보이는 미국 시장금리로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가계부채 부작용과 외국인 투자금 유출을 우려하는 방식으로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고위임원이 이날 "기준금리를 한 두번 올리는 것이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은법 제96조 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담아 작성한 뒤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한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오름세와 맞물리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었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0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고 평가했다. 증가속도도 빨랐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였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씀씀이를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해에는 현금이 늘면서 씀씀이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차입금 이자비용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씀씀이 여력이 줄어든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오른해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종전보다 0.23%포인트 상승한다. 하지만 비율이 오른 뒤 2년 후에는 증가율이 종전보다 0.14%포인트 깎인다. 3년이 흐르면 0.27%포인트 하락한다.
불어난 가계부채가 부동산을 비롯한 특정 자산에 몰리면 경제위기를 견뎌낼 흡수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도 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은 주택시장에 거품이 꼈거나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경기침체의 충격이 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 및 금융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한은은 "올들어 미국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부 취약국의 증시 투자금 유출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며 "터키 브라질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신흥국 중앙은행은 투자금 유출 우려에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흥국의 급격한 자금유출로 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부작용과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최근 한은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사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날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현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낮은 수준"이라며 "한 두번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정상화 시기를 실기해서는 안 된다”며 연내 인상론을 시사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인상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기준금리 결정과 별개로 하반기에도 국채매입을 추진할 뜻도 내비췄다. 박 부총재보는 "국채 단순매입은 앞으로 대외 요인과 국채수급 요인을 파악한 뒤 필요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