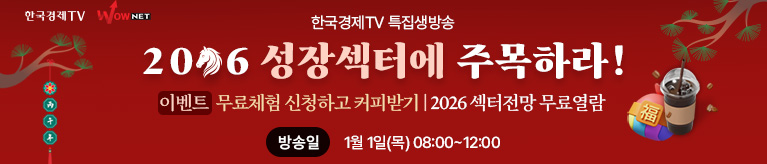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먼저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내 백신 개발업체 어느 곳과도 선(先)구매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한경 5월 18일자 A1, 8면). 이에 따라 한국형 백신이 나오더라도 백신 부족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 부족’ ‘특혜 논란’ 등의 이유를 대며 국내 5개 백신 업체 어느 곳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당장 수천억원의 개발비가 필요한 업체들은 할 수 없이 해외 지원을 받아 백신을 개발하고 이들에 우선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백신 선구매 및 개발 지원 명목으로 화이자 등 다수 업체에 14조1700억원을 지원했고, 이것이 백신 조기 개발 및 다량 확보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의 국내 백신업체 지원액은 1177억원으로 미국의 0.8%에 불과하다. 모호한 이유로 지원을 머뭇거리는 사이 국산 백신마저 해외로 뺏길 판이다.
정부의 백신행정은 헛발질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말 백신 늑장 확보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엉뚱하게도 ‘부작용’을 핑계로 댔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맞을 이유가 없다” “백신 안전성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다. 사과하는 대신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다 백신을 못 구했다는 추측도 있었지만, 국내 업체에 ‘짠물’ 지원에 그친 것을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정부는 선구매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핑계 대기도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뿌려댄 천문학적 돈을 생각하면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정부가 백신 확보의 중요성이나 절차를 몰랐거나 알았어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확보를 서두르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접종이 시작된 뒤에도 혼선은 계속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접종 여부와 대상을 두고 정부는 계속 오락가락을 반복했다. 부작용과 백신의 연관성 인정 및 보상에도 문제가 많았고, 해외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아직도 논란거리다.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이 61%에 불과하고 접종률에서 후진국이 된 것도 숱한 정책 난맥상으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정치를 배제한 과학,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신정책이라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외국산 백신 도입도 시급하지만,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