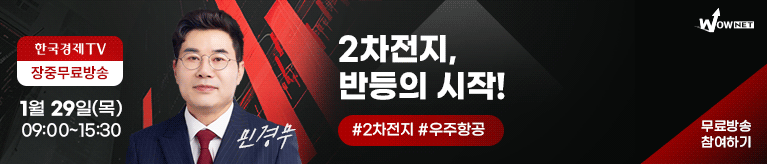“진정 위대한 화가는 다른 화가들의 그림 그리는 방식까지 바꾸는 사람들이다. 피카소처럼…. 데이비드 스웬슨은 투자 전문가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다.”
“진정 위대한 화가는 다른 화가들의 그림 그리는 방식까지 바꾸는 사람들이다. 피카소처럼…. 데이비드 스웬슨은 투자 전문가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다.”미국 예일대 기금의 투자위원장을 지낸 찰스 엘리스는 지난 6일 암 투병 끝에 작고한 데이비드 스웬슨 예일대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이렇게 평했다.
워런 버핏만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웬슨이 자산운용업계에 남긴 유산은 결코 버핏에 뒤지지 않는다. 운용 업계 종사자들은 버핏보다 스웬슨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쓴 책 ?포트폴리오 성공 운용?은 전 세계 CIO라면 모두 한 권쯤 소장하고 있는 ‘바이블’이다.
스웬슨이 예일대 기금을 맡은 건 1985년. 그의 나이 31세였다.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월가에서 일하던 그에게 CIO 자리를 제안한 건 지도교수였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이었다. 스웬슨은 월가에서 받던 연봉의 80%를 깎인 채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35년간 같은 자리를 지켰다.
1985년 10억달러(약 1조원) 규모였던 예일대 기금은 주식 60% 채권 40%의 ‘지루한’ 포트폴리오로 이뤄져 있었다. 스웬슨은 이를 싹 뜯어고쳤다. 채권은 꼭 필요한 유동성만큼만 보유하고 철저히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짰다. 사실상 영구히 운용되는 대학 기금 특성상 변동성은 크지만 길게 보유하면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더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다변화를 위해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헤지펀드, 천연자원 등 대체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다. 지금은 흔하지만 1980년대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다.
2020년 6월 현재 예일대 기금은 312억달러(약 35조원)에 달한다. 지난 30년간 연 12.4% 수익률을 기록했다. 예일대 총 운영비용의 34%를 기금이 책임진다. 교수 급여와 장학금, 연구비, 박물관 운영비 등으로 쓰고 남는 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투자한다.
스웬슨이 구축한 투자 전략 및 운영시스템인 ‘예일 모델’은 ‘대학기금 모델’이라고도 불린다.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미국 주요 대학 기금이 모두 예일 모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예일대 기금이 배출한 스웬슨의 수제자들이 수많은 대학 기금의 CIO로 활약하고 있기도 하다. 스웬슨 사단이다.
스웬슨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사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1980년대까지 일부 고액자산가만 투자하던 이 자산군을 기관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특히 예일대 기금은 트랙레코드가 없는 신생 운용사를 발굴하고 함께 투자 전략을 짜면서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파트너십으로 유명하다.
스웬슨이 67년의 짧은 인생에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천재성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투자 철학을 장기간에 걸쳐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기금 운용을 통해 대학에 기여한다는 한 가지 목표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대학들은 여전히 기금 대부분을 예금에 넣어놓고 있다. “주식에 투자했다 돈 잃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비전문가들의 목소리에 전문가들은 입을 닫는다. 연기금과 공제회 CIO들은 2년마다 임기가 끝난다. 투자 철학은커녕 업무를 파악할 때 즈음이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한다. 상전인 이사장들은 대부분 정치인이어서 투자 외에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다. 한국 자산운용업계에서 스웬슨과 같은 탁월한 리더가 나온다면 그건 기적이다. 지구 반대편 투자 천재의 때 이른 죽음만큼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