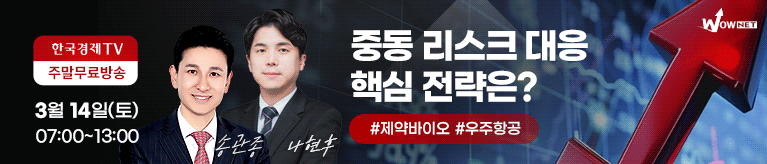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은 어떤 분야에 먼저 신경써야 할까. 전문가들 사이에선 ‘G(지배구조)를 갖추는 게 시작’이라는 견해와 ‘S(사회)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기업 가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E(환경)지만 단시간에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은 어떤 분야에 먼저 신경써야 할까. 전문가들 사이에선 ‘G(지배구조)를 갖추는 게 시작’이라는 견해와 ‘S(사회)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기업 가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E(환경)지만 단시간에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는 “ESG 평가 등급을 잘 받으려면 적절한 지배구조부터 갖춰야 한다”며 “대부분 ESG 평가에서 G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미래에셋·KB·한화·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등 주요 기관의 의뢰를 받아 ESG 평가를 한다.
그는 “일정 수준의 거버넌스 형태만 갖춰도 G 점수가 올라간다”며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회 구성 다양화, ESG·성과보상 위원회 설치 등 외형적 틀을 갖추는 작업부터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회사가 운용하는 책임투자펀드는 ESG 기반임에도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 최상위 성과를 내고 있다.
신 대표는 “공정성, 인권, 동물복지 등은 MZ세대(1980~2000년 출생자)가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라며 “이런 분야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인 기업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도 G의 중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기업 간 순위가 갈리는 승부처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신 대표는 “ESG를 중시하는 자산운용사들은 G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은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예선은 G, 본선은 S로 치러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는 사회적 이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제품을 막론하고 원료, 포장, 브랜드 정체성이 ESG에 부합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자회사를 정리한 일본 히타치를 좋은 사례로 꼽았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