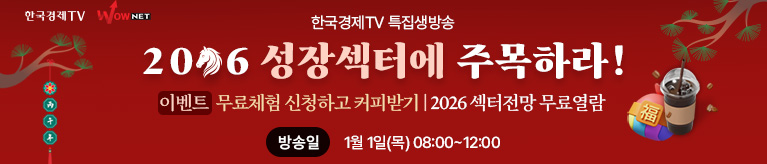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음악은 단순히 연주하거나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악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넓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연주하거나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악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넓습니다.”음악학자 정경영은 음악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생각합니다》에서 음악에 관한 폭넓은 통찰을 풀어낸다. 저자가 2011년부터 한양대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인간과 음악적 상상력’의 강의 내용을 책으로 옮겼다. 음악에 대한 정의와 표준이 정해진 과정, 향유 방식 등을 이야기한다. 그는 “누구나 음악에 관심을 두지만 음악의 본질을 쉽게 이야기하진 않는다”며 “박자를 못 타거나 음치여도 음악을 자유로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음악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게 이해의 첫걸음이다. 저자는 모든 이를 음악가로 본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음악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는 “음악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일정하게 흐르는 객관적 시간에 멜로디, 리듬, 강약 등을 통해 주관성을 부여하는 게 음악”이라며 “반복되는 일상에 강조점을 둬 자신을 위한 날로 바꾸는 사람도 바로 음악가”라고 주장한다.
음악에 대한 정의도 고정된 건 아니다. 예전에는 ‘인류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아름다운 소리를 질서있게 선보이는 예술작품’을 음악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의미가 확장됐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4분이 흘러가는 존 케이지의 ‘4분 33초’, 질서나 비례가 파괴된 소리들도 현대음악으로 분류된다.
저자에 따르면 서양음악에서 활용되는 음악 양식이 다양성을 훼손한다. 이른바 ‘표준어’라고 불리는 음계들이다. 장음계와 단음계 등 화성학이 보편화되면서 음악을 전파시켰지만 이것이 지역마다 있는 고유의 음악을 지웠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판소리나 미국의 재즈처럼 ‘도레미’ 등 표준음계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소리가 존재한다”며 “표준이 된 서양음악 틀에 맞추다 보면 개성이 사라진다”고 역설한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음악을 다르게 보니 정답은 없다.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우열을 가릴 수도 없다. 저자는 “다른 이들보다 성숙한 취향을 지닌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틀린 음악은 없다”며 “음악에 관한 편견을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음악성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