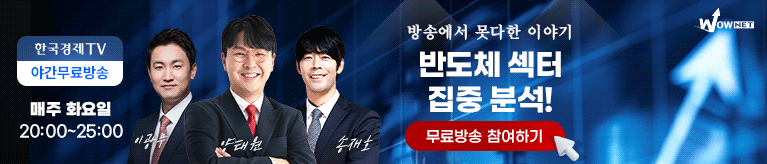도시에서 먹고 살기 힘들 때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농사가 마음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 육체노동에 몸은 고되고, 돈벌이는 되지 않고, 심어 놓는다고 작물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먹고 살기 힘들 때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농사가 마음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 육체노동에 몸은 고되고, 돈벌이는 되지 않고, 심어 놓는다고 작물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귀촌 후에 비로소 삶이 보였다》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40대 중반에 남들보다 빨리 은퇴하고 귀촌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장년의 이야기다. 귀촌한 지 10여 년이 지난 저자는 작은 텃밭과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고 목공 작업을 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다. 직장생활 때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자유롭고 행복하단다. 이런 자유와 행복은 그저 얻은 게 아니다.
농사지어 큰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먹고 살 만큼만 되면 좋겠다는 소소한 꿈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았다. 귀촌 첫해, 저자는 2000㎡(약 600평)의 밭에서 1년간 힘들게 농사지어 수확한 호박고구마를 내다 팔아 41만원을 벌었다. 자급자족의 꿈을 안고 텃밭에 온갖 채소를 키우지만 대부분 한 철만 수확하고 1년 중 절반 이상은 마트에서 사 먹어야 한다. 과수원은 묘목을 심고 나무가 자라서 정상적인 소득을 보는 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초창기에는 소득은 고사하고 지출만 있는 셈이다.
책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록한 생생한 농사일지가 담겨 있다. 저자는 처음에는 작물별로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 토마토를 너무 많이 심어서 수확한 토마토를 대부분 퇴비장으로 보냈고, 수박의 암꽃과 수꽃을 구별하지 못해 수박을 심어놓고 수꽃을 모조리 따버렸다. 수박이 모조리 시들어버린 후에야 잘못을 깨닫고 넝쿨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했다.
전원주택에서 사는 현실도 생생하게 전해준다. 마당에 잔디를 심으면 관리하기 힘들까 자갈을 깔아보지만, 틈새로 풀이 자라나 더 힘들어진다. 예초기를 돌리면 자갈이 튀어 날아가고 손으로는 뽑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겨울에는 강추위에 대비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보일러 고장이나 수도관 동파는 꼭 추운 날 밤에만 발생한다.
귀촌이란 ‘돈이냐 인생이냐’의 선택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귀촌을 고민하기 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인지,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삶인지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최종석 기자 ellisi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