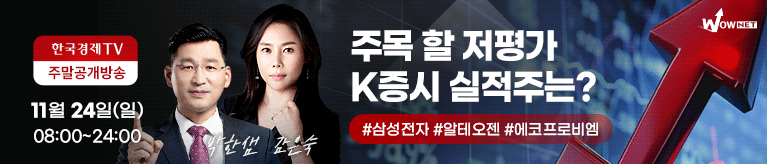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희망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대부분 민간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달성했다.
가장 큰 변화는 관련 기업의 숫자의 폭발적 증가다.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적인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필자가 처음 이 분야에 뛰어든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흔히 찾아볼 수 없었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에서 투자 검토를 진행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숫자는 3년 전만 해도 연간 50건이 안 됐다. 작년에는 이 숫자가 110건으로 늘더니 올 들어서는 벌써 50팀이나 검토했다. 이런 추세면 올해 300여 개 스타트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적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전문가들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네이버가 종합병원 교수를 스카우트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이 의사 약사 수의사 등을 채용하는 건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이 분야를 구성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이 높아진 것이다.
시장에 돈도 풀리고 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주목받으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전자 통신 유통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돈을 쓰기 시작했다. 벤처캐피털업계에서도 이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가 여럿 만들어지고 있다.
급속한 팽창에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묻지마’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가치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생태계 자체가 없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부작용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은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꽃이 피듯 민간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반복된 좌절로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악조건을 이겨내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환경적·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더욱 만개할 것이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은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꽃이 피듯 민간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반복된 좌절로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악조건을 이겨내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환경적·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더욱 만개할 것이다.최윤섭 <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