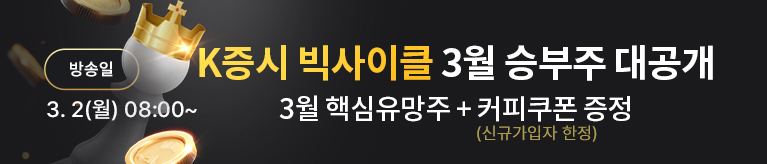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낙하산 인사’는 준엽관제 내지는 사실상 엽관제인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는 불가피한 것인가. 한국의 정당들은 야당 때는 예외 없이 정부·여당의 낙하산 인사를 욕하면서도 집권하면 어김없이 낙하산 인사를 시도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해서 정권 초기에는 논공행상처럼 노골적으로 하다가, 정권 후반기에는 조금씩 눈치를 보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권 말기에도 거침없이 시도되고 있다.
낙하산의 큰 문제는 정실(情實)인사로 인해 비(非)적격 인물이 공기업이나 각급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요직을 장악한 채 막중한 소임은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부실 확대, 비효율 증가, 경쟁력 저하 같은 모든 부작용은 국가사회의 부담, 즉 국민의 짐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중앙 정부 산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만 340여개에 달한다.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보면서도 교훈 못 얻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에 접어든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결국 임명권자 뜻대로 됐지만, 한국폴리텍대학처럼 여권 인사로 결정된 특정 이사장에 대해 총동문회 차원에서 ‘낙하산 중지’ 국민청원운동까지 벌어졌던 곳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민간 기업으로도 ‘유사 낙하산 인사’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현 정부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근래 기관장이 바뀌었거나 교체 인사가 진행 중인 곳 가운데 이른 바 친문(親文) 여권 인사가 꿰찼거나 내정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여수세계박람회 산업인력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서발전 등이 그런 경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2년6개월의 실형으로 법정 구속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김은경 재판은 내용으로 보면 전 정부 때 임명된 공기관 인사들을 무리하게 몰아내려했던 일에 대한 단죄였다. 1심이긴 했지만, 정권교체기 때 공기관 인사들 물갈이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처벌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의 본질은 엉터리 같은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판결을 보면서도 어둡고 떳떳치 못한 낡은 관행을 되풀이할 만큼 ‘자리 챙기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낙하산 인사가 이런 저런 배경에서, 때로는 비슷한 행태로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고용계약 관계는 당사자 간 자율의 일이기는 하다. 이 원칙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변신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최근의 몇몇 전직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해 여권을 맴돌던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낙하산 인사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뻔하지 않나. 대(對)국회, 대정부 등 대관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일종의 ‘로비’역할이다. 민간 기업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큰 손’도 문제지만, 그렇게라도 바람막이를 만들어둬야 하는 기업의 절박한 처지가 더 큰 문제다. 일련의 기업규제 입법과 규제 행정에 따라 기업들은 전 방위로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에 ‘선’이 잘 닿는 인사라면 불러들이고 때로는 보호막이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볼 것이다.
현관 로비서 반대 농성하는 노조와 뒤에서 '부임 협상'하는 한국적 광경
정권 초반의 낙하산 인사라면 논공행상 논란의 와중에도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새로운 인물 기용으로 ‘쇠밥통’이라는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일신해보려는 의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 말기의 무리한 낙하산은 ‘인사 알박기’에 그치기 십상이다. 적재적소의 적임이 아닌 낙하산 인사가 정해지고, 해당 인사가 자기 사무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어떻게 끌려 다니는 지는 너무도 익숙한 '한국적 전통'이다. 낙하산 인사가 내정되고 알려지면 노조는 대당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현관에 ‘농성 텐트’부터 쳤던 게 현실 아니었나. 그러면서 낮에는 해당 기관의 현관로비에서 반대 농성이 벌어지고, 밤에나 뒤로는 노조 쪽과 낙하산 인사측이 따로 만나 '부임 협상'을 벌였던 일도 비일비재했다. 수많은 공기관이 그렇게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속골병 들었다. 공기업의 비능률과 부실은 결국 국민 몫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