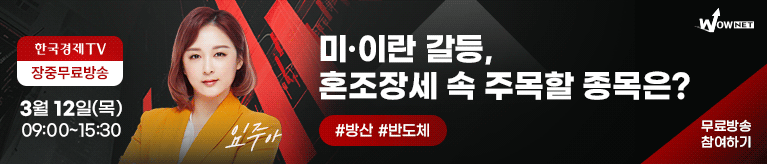얼마 전 ‘보호종료아동’의 삶을 다룬 기사를 봤다. 가정 형편 등의 문제로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어린 나이에 자립해야 하는 아이들의 처지는 너무나 가혹했다. “받아줄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들의 심정이 절절히 묻어나는 인터뷰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얼마 전 ‘보호종료아동’의 삶을 다룬 기사를 봤다. 가정 형편 등의 문제로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어린 나이에 자립해야 하는 아이들의 처지는 너무나 가혹했다. “받아줄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들의 심정이 절절히 묻어나는 인터뷰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부모의 부재, 부모의 양육 능력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살던 아이들은 만 18세에 시설을 나가 자립해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이런 아이들을 통칭하는 말로, 그때부터 법적 어른으로 분류돼 더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별다른 준비도 없이 떠밀리듯 혼자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 500만원의 자립 정착금과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자립수당뿐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창원 모녀 사망 사건과 이 사건을 다룬 시사프로그램(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단칸방의 유령들’ 편), 최근 개봉한 영화 ‘아이’ 등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미성년인 아이들은 정부 수당 외에 실질적인 지원이나 준비 없이 험한 세상에 내던져져 사회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무방비 상태로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단칸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해야 함은 물론 이들을 노리는 파렴치한 어른들에게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까닭에 사후관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달라고 손 내밀 어른 한 명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일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한 아동 6258명 중 26.2%에 해당하는 163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10명 중 2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퇴소 1년 차인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5%에 달하며 이 중 13.3%는 5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손을 잡아주는 일이다. 적십자의 긴급지원 SOS 프로그램처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최소한의 자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고 탄탄하게 갖춰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잘 적응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보호 종료가 자립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따뜻한 공동체로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