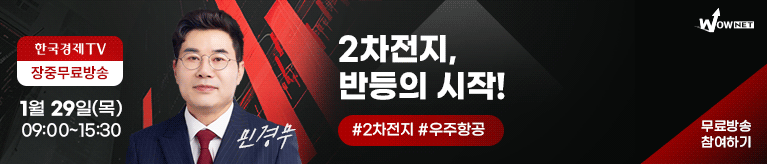“어디를 가든 그 공간과 빛을 눈여겨봐요. 내게 그림이란 공간과 빛이 만들어낸 기억들이 내 안에 작은 조각으로 모여 있다가 화폭을 통해 하나씩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진 추억의 빛과 에너지가 그림을 보는 분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22일부터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층 한경갤러리에서 초대전 ‘부유하는 공간, 기억’을 여는 강유정 작가(45)의 말이다. 캔버스에 아크릴로 작업한 회화와 판화 등 24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날카롭게 각진 기하학적 도형이 눈길을 끈다. 매끈한 질감, 직선이 빚어내는 날 선 구도와 달리 그의 작품은 차갑지 않다. 여러 겹으로 쌓인 노랑과 주황, 연두의 향연은 보는 이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강 작가는 학부에서 서양화를,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그래서 그의 작업에는 회화와 판화 기법이 어우러져 있다. 붓으로 캔버스의 바탕을 칠하고 그 위에 스텐실, 실크스크린 등 판화 기법을 얹거나 판화 작업 위에 붓으로 덧칠하기도 한다. 자신을 서양화가로도, 판화가로도 한정 짓지 않는 이유다. “판화로는 매끈하면서도 우연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붓으로는 내 감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에게 판화나 붓은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이지 한정시키는 틀이 아닙니다.”
강 작가는 최근 몇 년간 색채를 극도로 자제하는 작업에 집중해왔다. 이번에 소개하는 ‘memory of sea(바다에 대한 기억)’ 연작이 대표적이다. 명도와 채도를 변주한 단색화 같은 바탕,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동판으로 눌러 만든 공간이 있다. 나 자신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외롭고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탱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에게 전환점이 된 작품이 ‘space(공간)’다. 캔버스의 양 끝을 지탱하고 있는 샛노란 기둥. 그 사이 상단에는 새파란 색을 깔았다. 그가 작업하는 장면을 본 친구가 노란 기둥 하나는 자신, 다른 하나는 강 작가 같다고 했다. 그는 “‘네가 있어 외롭지 않다’고 위로해주는 것 같다기에 ‘그렇다면 내가 하늘을 선물할게’라며 파란색을 얹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그에게 해방감을 선사했다.
“판화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긴장을 풀 수 없어요. 공정이 복잡하고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죠.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중압감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계기로 그 중압감이 털어지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작품에서는 컬러를 다채롭게 사용했다. 특히 실크스크린과 스텐실을 이용해 파랑을 다채롭게 중첩한 ‘space of memory(기억의 공간)’는 하나의 컬러로 따뜻함을 표현한 작가의 역량을 보여준다. 파랑은 하나지만 여러 겹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느낌을 선보인다. 한 명의 자연인 안에 여러 개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나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미술관이에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신선한 자극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느낌을 받아요. 이번 작품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런 작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시는 3월 18일까지.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