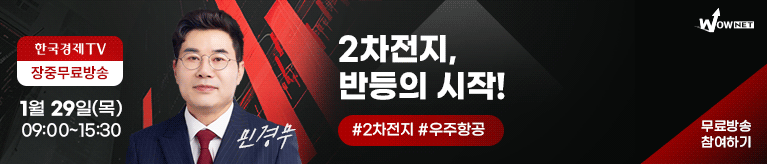이 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국제인권단체나 유엔만이 아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고, 영국의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법 시행 재고를 요청했다. 일본 아사히신문까지 사설에서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미국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해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법 개정 논리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이고, 실제 주민들의 우려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위협할 때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단 살포가 과도하다 싶으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단과 쌀, USB 등을 보낸다고 징역형까지 명시한 것은 과잉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국제사회의 상식적인 비판마저 외면하는 것은 ‘북한 비위 맞추기’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현 정부 들어 북한 눈치보기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우리 기업이 만든 금강산시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엊그제는 자기식대로 개발하겠다는데도 항의는커녕 유감 한마디 없다.
국제사회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을 ‘북한정권 연장 촉진법’으로 부르고,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를 의심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이 걸린 문제다. 상식적인 비판조차 내정간섭이라고 여기는 정부라면 인권탄압국으로 악명 높은 북한을 닮아간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