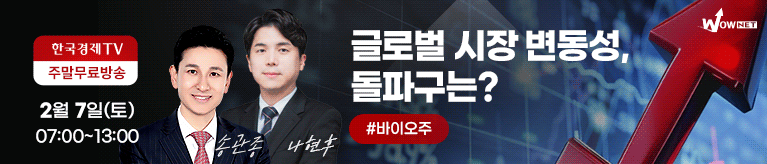“꼭 ‘고향의 봄’을 들려달라고 해요.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고향 생각이 나는지….”
경북 안동의료원 호스피스병동.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머무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 ‘기타 선생님’ 권종대 씨(68)의 작은음악회가 열린다. 모든 소리는 절반 크기에, 속도는 2~3배 느린 연주회다.
권씨의 다이어리에는 봉사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다. 병동의 음악봉사 외에도 홀몸노인을 돌보는 나눔동행봉사, 시니어 멘토링 등으로 1주일을 보낸다.
권씨는 32년간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했다. 고객만족상, 자랑스러운 우체국장상 등을 수차례 받을 정도로 성실했다. 그런데도 막상 퇴직이 눈앞에 다가오자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섰다고 했다. 그는 “이러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을 보내면 어쩌나 겁이 났다”며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하며 몸에 밴 친절함을 이용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고, 그러다 떠오른 게 봉사였다”고 말했다.
 권씨는 웰다잉 지도강사,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땄다. 병동에서 기타 연주자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6개월간 손끝에 굳은살이 배도록 연습했다. 봉사하며 만난 이들과 아예 봉사단체까지 꾸렸다. 2014년 안동상록봉사단을 창설해 현재 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권씨는 웰다잉 지도강사,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땄다. 병동에서 기타 연주자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6개월간 손끝에 굳은살이 배도록 연습했다. 봉사하며 만난 이들과 아예 봉사단체까지 꾸렸다. 2014년 안동상록봉사단을 창설해 현재 단장으로 일하고 있다.권씨는 홀몸노인 김모씨(83)를 수년째 돌보고 있다. 가족들이 떠나고 우울감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그에게 권씨가 손을 내밀었다. 1주일에 한 번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청소와 빨래 등을 돕는다. 권씨는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내 역할이 생겼음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다.
권씨는 “매일 움직이고 대화하면서 몸도 건강해졌다”며 “퇴직 후 우울감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를 지낸 남충일 씨(86)는 직장생활 동안 닦은 영어 실력을 활용해 은퇴 후 각종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매주 수요일엔 국제구호개발기구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영어 공문서나 편지 등을 번역하고, 목요일에는 서울의료원에서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 통역을 해준다. 금요일에는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를 돕는다.
남씨는 은행과 무역회사 등을 거쳐 1993년 배터리 제조업체인 세방전지 사장을 끝으로 직장생활을 마쳤다. 유창한 영어 실력은 무역회사 등에서 일하며 습득한 것이다. 남씨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각박한 현실에 쫓겨 자원봉사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은퇴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과 사회로부터 은혜를 입은 만큼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오랜 기간 그는 “남을 도우면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인생의 남은 목표를 묻자 “건강하게 봉사하며 살다가 곱게 이승을 하직하는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
안동=최다은/양길성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