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니, 오라클, 폭스바겐, HSBC, 지멘스, 화이자, 카르푸, 유니세프, 가톨릭교회, 캘리포니아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역사를 만들어 온 유서 깊은 기업 또는 비영리조직? 아니다. ‘히든 챔피언’의 경영사상가 개리 해멀과 경영컨설턴트 미셀 자니니는 신작 《휴머노크라시(Humanocracy)》에서 이들을 관료주의 조직의 전형으로 꼽았다.
소니, 오라클, 폭스바겐, HSBC, 지멘스, 화이자, 카르푸, 유니세프, 가톨릭교회, 캘리포니아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역사를 만들어 온 유서 깊은 기업 또는 비영리조직? 아니다. ‘히든 챔피언’의 경영사상가 개리 해멀과 경영컨설턴트 미셀 자니니는 신작 《휴머노크라시(Humanocracy)》에서 이들을 관료주의 조직의 전형으로 꼽았다.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어떨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가 부임하기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는 분명히 그랬다. MS는 탁월한 혁신기업으로 출발했지만 PC 기반 운영체제의 공룡이 되면서 동맥경화에 걸렸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하기 전인 2009년 MS의 개발팀은 탁월한 태블릿 ‘쿠리어(courier)’ 시제품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스티브 발머는 윈도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을 중단시켰다. 이런 식으로 검색엔진, 태블릿,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새로운 변화에 늘 뒷북만 치면서 쇠락일로를 걷다가 나델라 취임 후 힘겹게 기사회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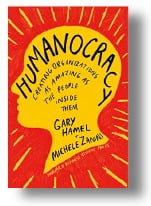 18세기 초 ‘책상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뷰로크라티(bureaucratie)’라는 단어가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다. 완고하고 경직된 인상을 주기는 했지만 분명히 강점이 있었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야말로 정확성, 안정성, 엄격성, 신뢰성 측면에서 과거 어떤 조직 형태보다 탁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이후 관료제를 채택한 서구 대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촉발했고 20세기에 풍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관료제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대표적인 조직 구조로 자연스럽게 정착했다.
18세기 초 ‘책상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뷰로크라티(bureaucratie)’라는 단어가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다. 완고하고 경직된 인상을 주기는 했지만 분명히 강점이 있었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야말로 정확성, 안정성, 엄격성, 신뢰성 측면에서 과거 어떤 조직 형태보다 탁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이후 관료제를 채택한 서구 대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촉발했고 20세기에 풍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관료제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대표적인 조직 구조로 자연스럽게 정착했다.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노동자의 지식수준과 자존감에 대한 요구는 전례 없이 높아졌다. 위에서 내려온 KPI(핵심성과지표)에 목을 매는 순응형 인간이기를 거부한다. 자유, 창의, 열정, 유대, 기여, 성취와 같은 상위의 욕구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료주의(bureaucracy)는 일종의 ‘부드러운 독재(soft tyranny)’로서 항상 이를 억압해왔다.
이게 아니란 걸 다 알면서도 왜 이리 바꾸기 힘든가? 최고경영자(CEO) 이하 모든 관리 계층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심리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해진 구조 때문이다.
저자는 그 대안으로 ‘휴머노크러시’를 제안한다. 한때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집단소유기업이었던 중국 가전회사 하이얼이 장루이민 회장 취임 후 바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영자가 세계관을 바꾸고 체계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농업기업 모닝스타, 철강기업 뉴코, 원단기업 고어, 스웨덴 은행 스벤스카 한델스방켄, 네덜란드 헬스케어기업 부르트초그, 프랑스 시설물 운영기업 빈치 등이 한결같이 휴머노크러시를 구현하는 데 성공한 사례들이다. 이곳에서는 중앙통제와 계획 대신에 분권화된 단위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그 성과에 책임을 진다. 자유를 과도하게 부여하면 자칫 일탈과 안일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업계 최고의 혁신 및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느슨한 조직이 아니다. 오직 능력주의가 지배한다. 평범한 성과를 내는 데 그친 구성원이나 리더는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그러면서도 팀 단위 협업은 오히려 구성원 사이에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한다. 또 위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나 리더가 있다. 경직되고 비대한 위계가 나쁜 것이지 역동적 위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리더는 상부에서 일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는 능력자라야 올라간다.
비현실적으로 들리는가? 그렇다면 이미 관료주의에 젖은 것이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훗날 휴머노크러시가 새로운 조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을 때 관료주의를 혁파한다고 부산을 떤다면 이미 늦다. 지금도 ‘규정상 안 돼’ ‘일이나 해’ ‘내 소관 아니야’와 같은 말들이 습관처럼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송경모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