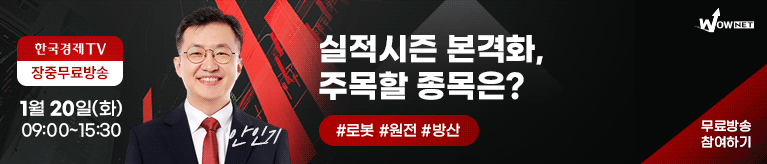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한 기업 75개(스팩 제외) 중 지난 8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낮은 곳은 모두 31개(41%)로 집계됐다. 상장 첫날 종가보다 최근 주가가 하락한 기업도 33개에 달했다.
2005년 코스닥시장에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은 당장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작더라도 기술력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상장시키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 등 전문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 결과 일정 등급(A 또는 BBB) 이상이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나 매출액 요건 없이 자기자본(10억원)과 시가총액(90억원) 요건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공개(IPO)는 물론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미실현 이익 등 미래 실적을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등 ‘뻥튀기 논란’도 제기됐다. 2015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의료기기 업체 유앤아이는 최근 주가가 공모가 대비 85% 이상 빠졌다. 2017년 상장한 항공기 부품업체 샘코도 공모가 대비 82% 하락한 상태서 지난 3월 거래가 정지됐다. 에코마이스터(-60.5%), 네오펙트(-56.7%), 바이오리더스(-53.5%) 등도 공모가 절반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감독당국도 바이오를 중심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공모가 뻥튀기가 공모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6개 기업에 실적 추정치 재산정 등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엔 주요 증권사 IPO 담당자들을 소집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창현 의원은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 경우엔 3~5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통해 상장 유지를 결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