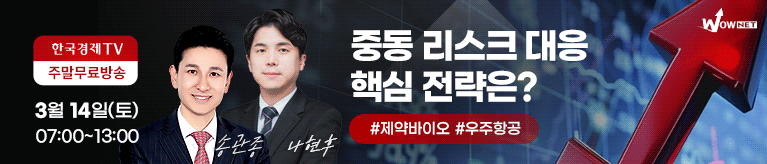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보수’ 지지층에게 결과는 암담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진보’ 세력에 넘겨줬다. 정치 지형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게 아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 패배까지 보수는 궤멸해 왔다. 수년째 이어진 한국 보수의 몰락과 무기력함.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보수’ 지지층에게 결과는 암담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진보’ 세력에 넘겨줬다. 정치 지형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게 아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 패배까지 보수는 궤멸해 왔다. 수년째 이어진 한국 보수의 몰락과 무기력함.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에서 300년 넘게 생명을 이어온 영국 보수의 역사를 되짚어 한국 보수의 미래를 논한다. 저자는 1670년대 ‘토리’란 이름을 내걸고 등장한 영국 보수당에 주목한다. 그는 “농경사회부터 지금까지 300여 년 넘는 역사의 도전 속에서도 영국 보수당은 살아남았다”며 “‘보수’란 케케묵은 꼬리표를 단 정당이 어떻게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영국 보수당이 권력을 잡은 요인으로 세 가지를 집어낸다. 권력욕을 이념 수호보다 앞세웠다. 교조적으로 굴지 말고 현실에 자신을 맞추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영국 보수당 기반을 닦은 벤저민 디즈레일리 전 총리의 말을 인용해 설명한다. “디즈레일리는 생전 ‘원칙은 버리고 당에 충실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며 “이념보다 권력을 장악하는 실용적인 정당이 되라는 주문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현실과 타협하려면 유연성이 필요하다. 보수당이라고 사회 변화를 고집스레 거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은 개혁 청사진을 그리는 데 취약했다. 현상 유지를 원해서다. 다만 반동적인 모습은 없었다. 내줄 건 내주는 영리한 양보를 통해 기득권을 뿌리째 위협받지 않도록 했다. 만일 있는 그대로를 지키려 했다면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영국 보수당은 협상 테이블에 홀로 앉지 않았다. 지주계급부터 귀족, 나아가 상공업자·중산층·노동계급·여성까지 끌어와 중책에 앉혔다. 저자는 “귀족이나 특정 대학 출신만을 위한 배타적인 정당이 아니라 다수를 포용하는 당으로 변하려 애썼다”며 “애국주의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요소를 보수당 전통에 포함시키고 사회 개혁을 이뤄온 게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한다. 이어 “300년 영국 보수당 역사에 갈등이 계속됐지만 파멸로 이어지지 않았고 위기 때마다 자기 혁신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디즈레일리, 마거릿 대처 등 위대한 지도자들도 변화에 한몫했다”고 강조한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