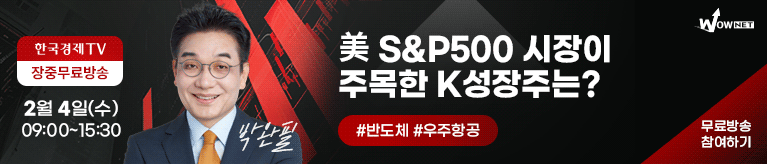주택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처음 맞은 가을 이사철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방을 빼라” “싫다”로 맞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 말로 안 돼 분쟁조정 신청까지 가면서 원수가 되는 사례도 있다. 상가임대차 시장도 비슷하다. 지난달 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직후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 입점 상인들이 월세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빌딩 측은 코로나가 터진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이미 깎아주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상인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주택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처음 맞은 가을 이사철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방을 빼라” “싫다”로 맞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 말로 안 돼 분쟁조정 신청까지 가면서 원수가 되는 사례도 있다. 상가임대차 시장도 비슷하다. 지난달 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직후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 입점 상인들이 월세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빌딩 측은 코로나가 터진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이미 깎아주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상인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이런 갈등과 대립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는 정책이 주원인이지만 법 자체가 엉성하게 고쳐진 탓도 크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계약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을 내보낼 때 2년 내 새 세입자를 들이면 안 되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몇 개월 살다가 집을 팔아도 되는지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감염병 등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지만 감면폭과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법의 이런 허점을 둘러싼 실랑이는 법원까지 가야 한다.
모두 국회가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 없이 법 개정을 서두른 결과다. 더 심각한 건 부실 입법을 한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하는 국회’를 구현했다고 자랑한다. 그게 더 문제다. 상당수 의원은 열심히 일한 실적으로 입법 발의 건수를 내세운다. 일부 시민단체도 법을 몇 개 발의했느냐로 의원들을 줄세운다. 의원입법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규제 심사와 공청회 생략을 노린 정부의 청부입법이 늘어나는 이유다. 지난 20대 국회 4년간 발의된 의원입법만 2만3047건이다. 19대의 1만6729건에 비해 37.8% 많다.
21대 국회는 아예 ‘입법 중독’ 수준이다. 임기 시작 4개월여 만에 4085건(7일 현재)의 법안을 발의했다. 300명 국회의원 1인당 14건꼴이다. 현행 법률 1480개의 세 배에 달한다. 이런 속도면 21대에 의원입법 발의가 20대를 두 배 이상 앞지르는 5만 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의원 간 입법 경쟁이 불붙으면 폐기 법안을 재탕 삼탕하거나 자구 하나만 쉬운 말로 고치는 ‘알법(알기 쉬운 법)’, 특정 위원회를 모든 정부기관에 두자며 각 기관법마다 이를 추가하는 ‘복붙법(복사해 붙인 법안)’ 등이 판친다. 오죽했으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법 같지도 않은 법이 너무 많다”고 개탄했을까.
법을 벽돌 찍듯이 양산하다 보니 졸속인 건 당연하다. 법률연맹이란 입법 감시단체가 20대 국회의 24개 법안심사소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다. 4년간 연 회의는 634회, 회의 시간은 총 1758시간13분이었다. 여기서 심사한 법안 수는 누계로 4만3453건. 법안 한 건당 평균 2분26초 심사한 셈이다. 제·개정 내용을 한 번 읽어보기도 모자란 시간이다. 입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법안심사소위가 이 정도면 상임위와 본회의는 볼 것도 없다.
아이러니컬한 건 의원들이 입법을 늘릴수록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의 양적 확대는 필연적으로 질적 저하를 초래해 정부의 시행령과 유권해석이 더욱 중요해져서다. 주택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토교통부가 해설집을 세 번이나 내고 유권해석 문의로 법무부 전화통에 불이 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법은 대충 만들어 놓고, 정부 재량권을 키워주는 것은 입법부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법치의 정도(正道)도 아니다.
법은 강제력 있는 규범이란 점에서 대부분이 규제다. 규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고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한 번 생기면 없애기도 어렵다.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아예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본회의 개최를 늘리는 게 골자다. 더 많은 법을 제·개정하겠다는 얘기다. 마구잡이로 쏟아낸 법들은 시장을 흔들고 국민 갈등만 부추긴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일 안 하는 국회’가 낫다.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