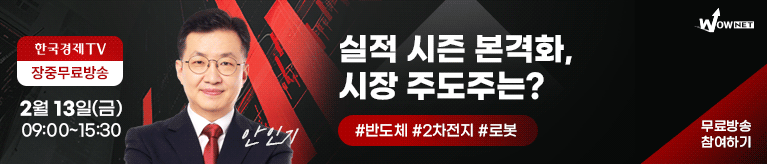정권이 바뀌었어도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이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출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에 오른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던 약속이 무색하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요구로 우량 공기업들까지 적자전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터라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더 크게 다가온다. 2016년 15조원을 웃돌던 공공기관 337곳의 전체 순이익이 지난해 5000억원대로 급감했다. 이런 마당에 낙하산 경영진이 실적 개선을 이끌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공기업 부채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게 뻔하다. 아울러 정권이 공무원들을 줄세우는 전형적 통로로 낙하산 인사를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부처 차관급 정도면 선거 때 차출해 여당 후보로 출마시키고, 떨어질 경우 공기업 임원 자리를 주는 식이다.
민주당은 야당시절 ‘낙하산 인사’를 줄기차게 비판해왔다. 금융권 낙하산을 차단한다며 2016년 금융회사 임원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자격요건을 명기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지금 여당이다. 적폐 청산을 내걸고 집권한 정권이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정권 전리품’으로 여기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도대체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가.